찬바람 부는 가을, 맛있는 영화 어떠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영화
무더위에 잠을 설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초가을이 다가왔다.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더위에 지쳐 잃었던 입맛을 자극하고 마음도 채워줄 영화 네 편을 소개한다.
나는 이 일을 사랑해 - 아메리칸 셰프

이 영화는 유명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일하던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와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성공한다는 뻔하고 식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 가능한 줄거리를 무색케 화면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영화의 큰 매력이다. 화면 가득 요리하는 장면이 들어차 보고 있으면 침이 꼴깍 넘어간다. 영화 뒤에 깔리는 흥겨운 남미 음악은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 배가한다. 가족들과의 사이도 엉망인 주인공 칼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라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칼은 레스토랑을 관두고 전 아내의 조언에 따라 푸드 트럭에서 쿠바 샌드위치를 팔게 된다. 푸드 트럭을 몰면서 가족과의 관계, 특히 아들과의 어색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모습 또한 어찌 보면 흔한 설정이지만 아들과 함께 원하던 일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유쾌해진다.
평범한 나도 할 수 있어 - 줄리 & 줄리아

영화는 두 명의 주인공 있고, 이 둘 사이에 5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 1949년,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프랑스에 온 줄리아는 프랑스 생활이 어렵기만하다. 그런 생활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남편의 물음에 줄리아는 먹기라고 대답한다. 2002년, 뉴욕에 사는 줄리는 퇴근 후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취미이다.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줄리는 365일 동안 524개의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두 주인공을 교차해 보여주면서 줄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다. 요리는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둘에게는 옆에서 맛보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두 사람의 남편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둘은 남편에게 말한다. “자긴 내 버터이자 인생의 숨이야.” 영화에서는 남편이었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독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또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줄리아가 요리를 시작한 것은 삶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죠. 그러다 인생의 즐거움을 알았고요. 줄리아가 깨닫게 해줬죠.’ 요리를 통해서 두 사람은 인생을 찾아간다. 줄리아와 줄리는 요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서로 비슷하지만 각자가 이뤄낸 것은 다르다. 줄리는 줄리아의 영향을 받았지만 줄리아와 다른 새로운 성공을 얻어냈다.
지친 나에게 위로 - 리틀 포레스트 : 여름과 가을
 |
||
조용하고 잔잔한 힐링 - 카모메 식당

이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핀란드 헬싱키이다. 주인공이자 카모메 식당의 주인인 사치에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눈을 감은 채 아무 데나 찍은 곳이 저 곳이기 때문이다. 영화가 전개되는 헬싱키는 이국적인 공간이라 보고 있으면 새로운 느낌이 든다. 갓챠맨(독수리 오형제)의 주제곡 가사를 아냐는 다소 엉뚱한 물음으로 닿은 인연들이 카모메 식당에 모인다. 오니기리를 대표 메뉴로 일본가정식을 하는 이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 각자의 사연으로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카모메 식당에서 모인 여자 넷이 해변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은 한가롭기 그지없다. 이 장면에서 일본어로 갈매기를 뜻하는 식당이름이 문득 떠오른다.
위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요리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을 찾아간다. 자신이 뭘 원하는 지도 잘 모르는 요즘 세대들에게 한편으로 이들은 부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친구, 이웃들. 이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하루하루가 막막한 우리들에게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자고로 잘 먹어야 한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은 못 먹더라도 꼭 따뜻한 끼니를 챙겼으면 한다. 개강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한 끼 밥과 좋은 영화로 재충전했으면 한다. 다시 시작이다.
전현정 수습기자
ummami@hwangryong.com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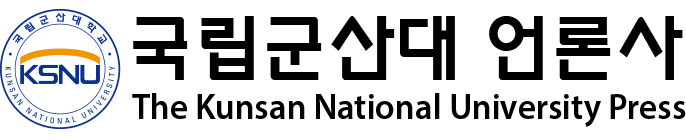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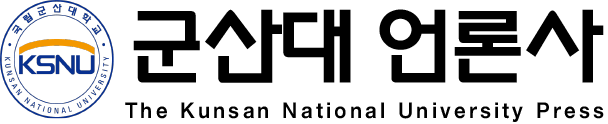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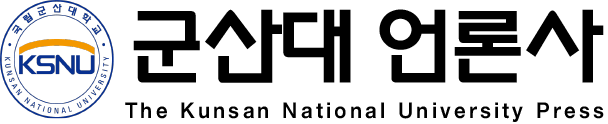
![국립군산대 신문 559호 [신년호] (2024-01-04)](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2024/02/atbhot_202402140527.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