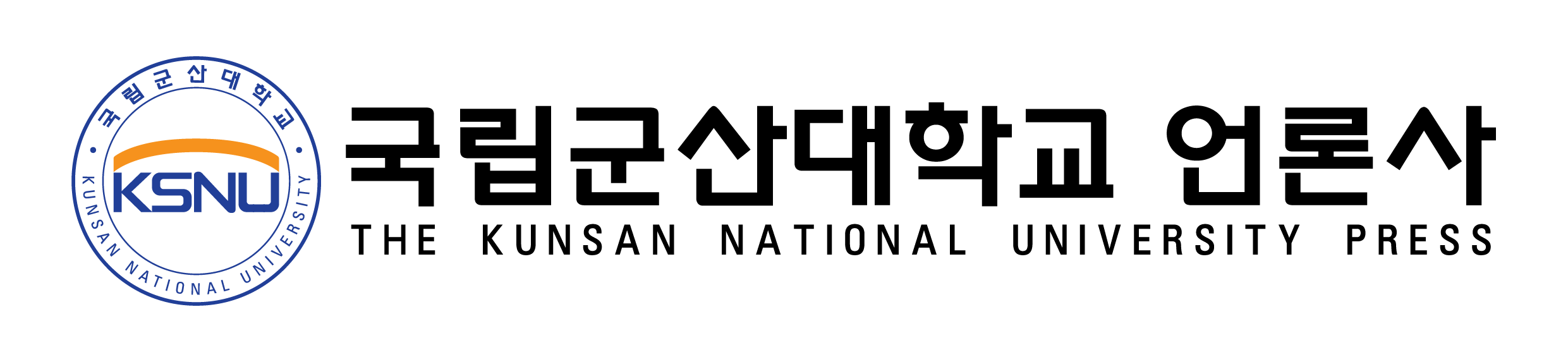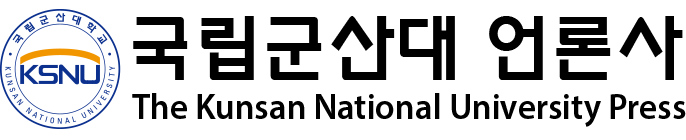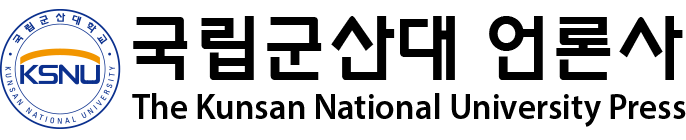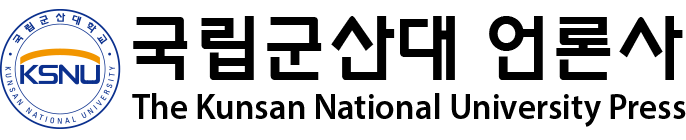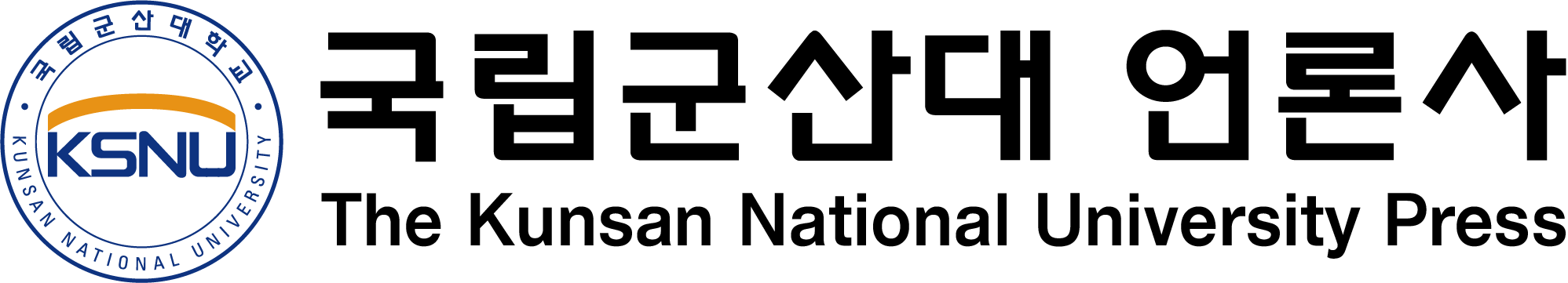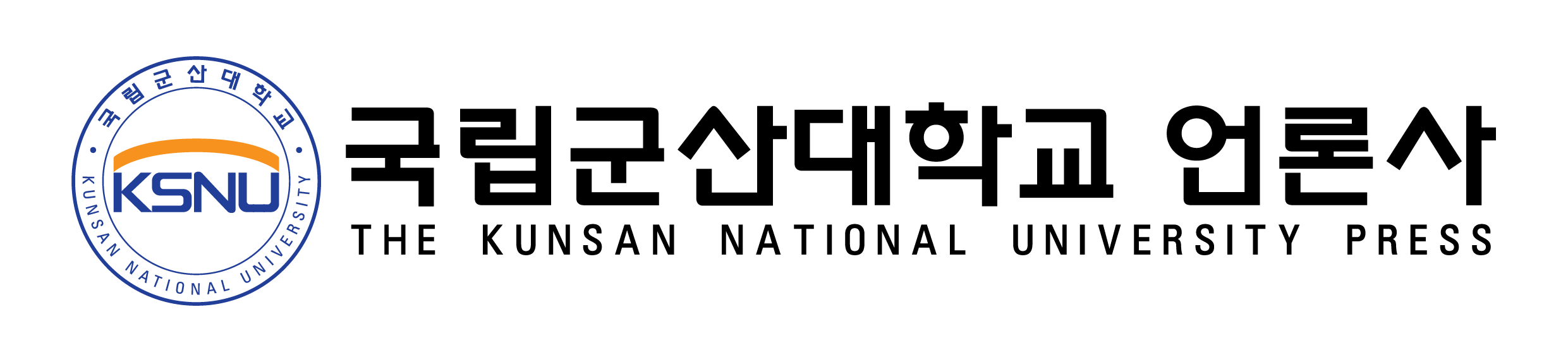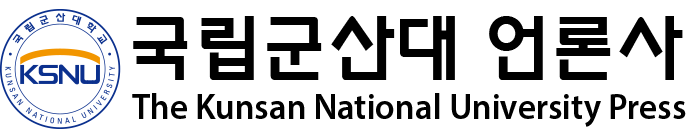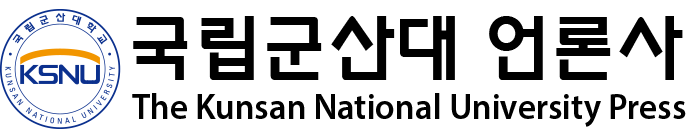도묘(盜猫)
하루종일 케케묵은 그림자가 내리는 낡은 쓰레기통이
나에게 그립고 정든 고향이 되었고
반쯤 미라가 된 고등어와 못다핀 곰팡이 꽃 한송이가
나에게 숨을 내쉬게하는 만찬이 되었고
귀신 나온다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폐가가
나에게 유난히 새벽별이 잘 보이는 전망대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새벽별을 담는 눈을 가졌고,
쥐방울따위에 얽히지 않고 어디든 가는 작은 발을 가졌다.
하지만 불청객처럼 자기 주인에게 쫒겨난 내 친구 나비는
쥐약먹은 쥐가 자기 신세처럼 가여워 그를 깨물었다고 한다.
멍청한 것아- 불쌍한 것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훔쳤길래 갈대처럼 쓰러지는가
나 역시 그녀의 집을 나왔을 때 우습게도 겨울비가 내렸다.
우수에 젖은 내 눈에 멀리서 별 하나가 달려들었고
광무하는 벌레들처럼 나도 미친듯 신이난다.
세상이 금세 깃털처럼 가벼워져 철근처럼 무거워졌고
나는 냉동식품처럼 차갑게 굳어져간다.
"에이, 재수없게시리."
별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려고 떠났기에
나는 해바라기처럼 서럽게 울어댔다.
엄마- 여보-
그날 밤, 나는 당신을 애타게 부르며 찾았고,
당신은 시끄럽다며 낡은 창문에 커튼을 쳤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