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황룡학술문학상 문학부문 가작 수상작 (수필)
삶을 다루는 법
삶을 다루는 법
얇은 반팔을 집어넣고 카디건을 꺼냈다. 땅거미가 질 때 즈음엔 절로 몸이 떨리기 시작한 탓이다. 친구와 끼는 팔짱이 어쩐지 반갑다. 옆에 선 이의 체온이 기분 좋게 뜨끈하다. 그렇게 눅눅한 늦여름이 선선한 초가을로 바뀐다.
가을바람이 불면 내 마음은 하늘을 난다. 기뻐서 날기보단 어쩔 줄 몰라 나는 게 맞을 것이다. 이전보다 불쑥불쑥 차오르는 마음속 차돌멩이의 이름은 우울인지 자책인지 제멋대로 엉겨 붙어 알 수 없다. 문득문득 떠오른다. 길을 걷다가, 수업을 듣다가,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버스를 타다가, 상관하지 않고 계속 스무 살의 내가 떠오른다. 줄초상이라고, 듣기만 했지, 나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 먼저 간 사람이 안쓰러워서, 내가 안쓰러워서 견딜 수 없는 밤이 온다.
잠이 오지 않아 불을 끄고 그저 가만히 누워 있다. 눈을 감고 몸을 뉘면 문득 생각나는 얼굴이 있다. 지나가듯 말했던 담소가 떠오른다. 내가 복중에 있을 때 엄마는 종종 눈을 감고 나를 더듬더듬 헤아렸다고 했다.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그냥’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 ‘그냥’이라는 말이 ‘사랑해’보다 좋아서 마음속에 고이 담아둔 날이 있었다. 그저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나름 심장 한편에 난로를 놓아주었다. 그 대화를 하며 내가 긴팔을 입고 있었던지, 몇 살이었던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다람쥐 굴에 놓인 도토리같이 사랑이 고파지면 하나씩 꺼내곤 하는 것이다. 좋은 기분이었냐고 물으니 ‘신기했다’라는 답이 나오기도 하였다.
몽글한 그 감정 근저엔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있었을까? 지금은 물어볼 수 없다. 이젠 가물가물해진 그 목소리로 대답을 듣기 위해선 꽤 긴 밤을 지새워야 할 것이다. 언젠가 그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땐 나도 새로운 이를 가족으로 맞는다는 것일 테다. 그런 상상을 어둠 속에서 홀로 이어가다 보면 까마득한 토닥임이 온다. 그럼 어느샌가 아침이 오고 나는 엄마가 준 숨으로 깨어난다.
힘든 시기였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도 해는 지나갔다. 시간은 무정하지만, 고맙게도 계속 흘러준다. 살다 보면 살아진다는 어느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반년 동안 꾸준히 방구석을 차지한 괴로움은 가끔 찾아오는 친구로 바뀐 지 조금 됐다. 난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다시 성적을 걱정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고, 기념일을 챙기며 살고 있다. 이젠 레시피를 굳이 안 봐도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제법 된다. 강된장은 아직 된장 조절이 어렵지만 말이다.
아직 살아 보지 못한 앞으로의 날들을 헤아려본다. 괜스레 손을 펴 생명선을 찾아보기도 하고 타로점도 해봤지만, 여전히 알 수 없다. 그저 어떻게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만 가득하다. 더 많은 곳에 가보고 싶다.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그림을 좋아하고 언젠가 정원도 가꿔보고 싶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되고 싶다. 구구절절한 인생보단 담백한 인생이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냈다고 말하는 비옥한 노인이 되고 싶다. 이따위 같은 것들.
감정은 무뎌지는 게 아니라 묻어지는 거더라. 종종 내 속에서 지진이 나서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고 아무 이유도 없이 기어코 나오기도 한다. 그래도 다시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 어쩌면 작거나 큰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귀인이 와줄지도 모른다. 삶의 온도가 있다면 딱 이정도였으면 한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온도 정도면 나름 행복한 삶일 것 같다.
끊임없이 하루의 삶이 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 사이에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여전히 모르겠지만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옷 따뜻하게 입는다. 그럼 힘들어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사랑하려 한다.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한혜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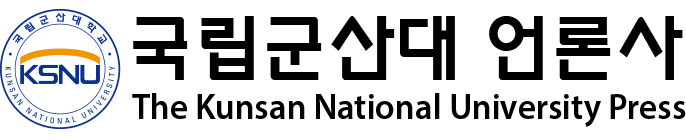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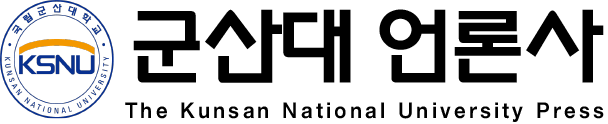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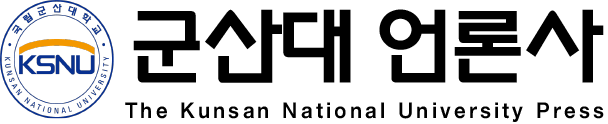
![국립군산대 신문 559호 [신년호] (2024-01-04)](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2024/02/atbhot_202402140527.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