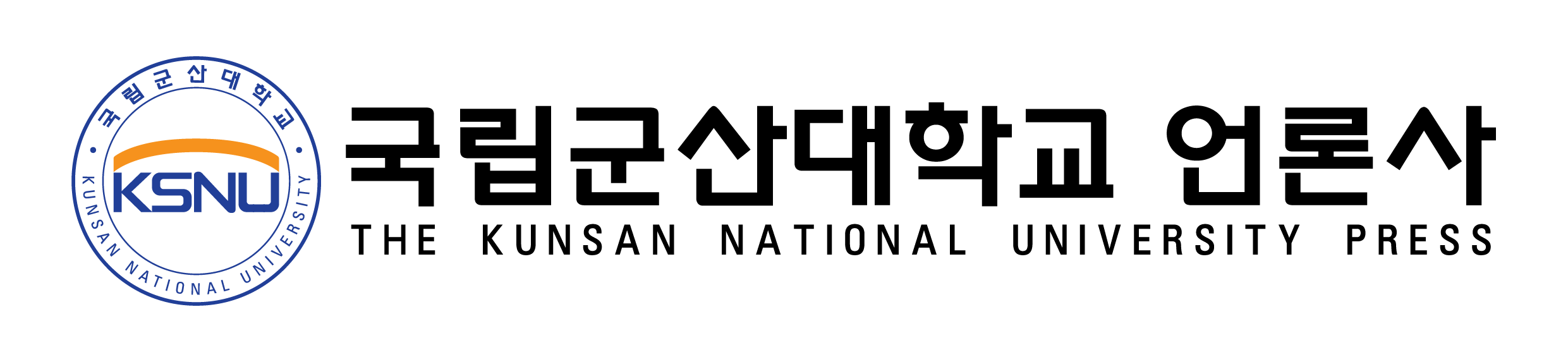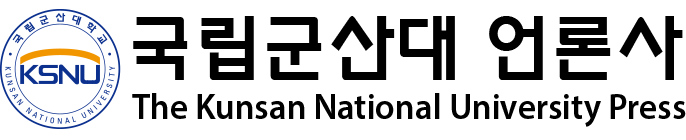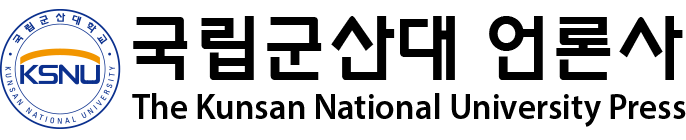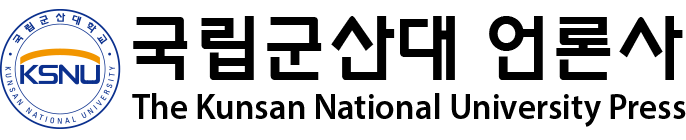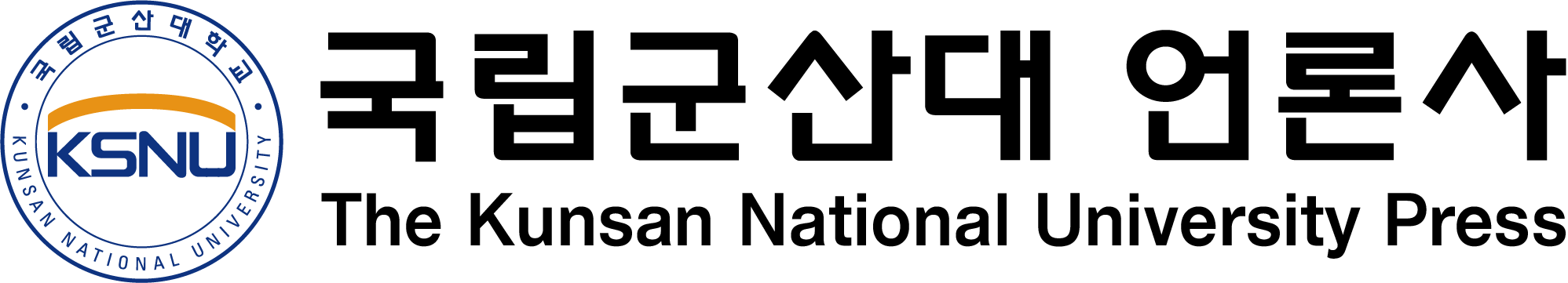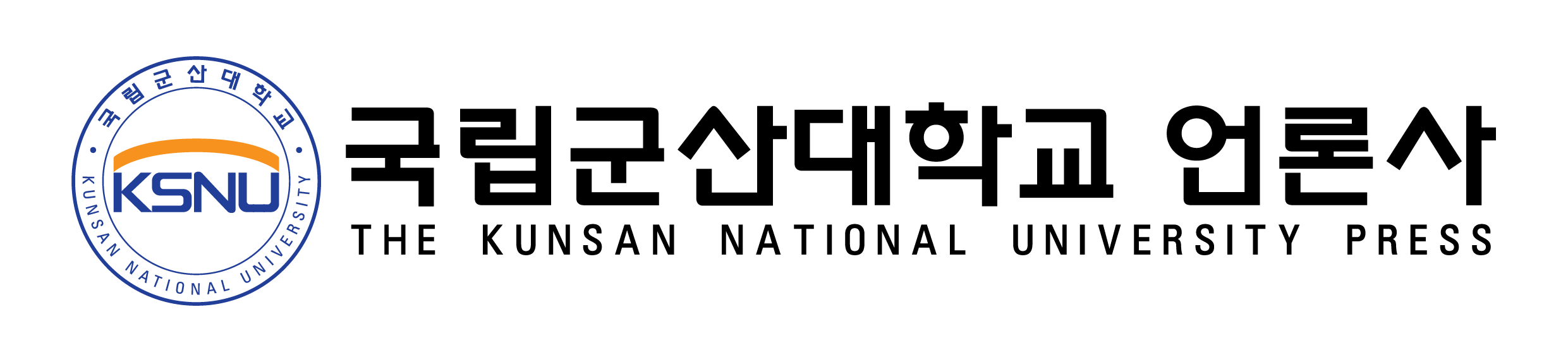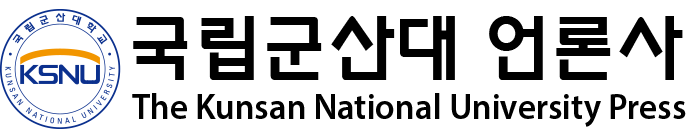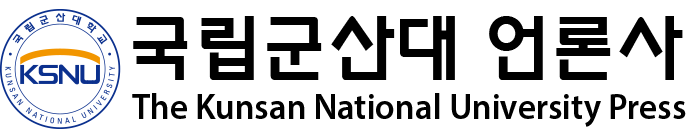제40회 황룡학술문학상 문학부문 가작 (수필)
가면극에 초대 받았습니다.
가면극에 초대 받았습니다.
중세 배경의 흔해빠진 로맨스 소설처럼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지런히 수놓는 연회장에서만 가면무도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커피의 그윽한 향이 희미하게 넘실대는 카페 안에서도, 사정없이 마룻바닥에 패대기쳐지는 공의 불협화음이 고막을 찌르는 학교 체육관 안에서도, 호스트를 알 수 없는 가면무도회가 시시때때로 개최되고 있다. 그 가면무도회는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지만, 복장 규정조차 준수하지 못한 무감각한 사람이 문턱을 넘는 순간 소슬한 바람이 그 사람에게로 사정없이 몰아쳤다.
이렇게 매번 문전박대를 당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 바로 나였다. 이질적으로 일그러진 턱을 지니고 세로로 기다란 내 얼굴에 맞는 가면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매번 민얼굴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무도회장으로 향했다. 마치 누군가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인해 투명한 유리판에 콕 박힌 쇠 구슬,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깍두기 한 조각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차라리 항상 유령처럼 무표정 또는 우울한 표정을 유지하는 내 얼굴을 누가 감쪽같은 가면이라고 착각해주었으면 좋겠다.
무도회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문턱을 밟는 순간, 부뚜막 위에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처럼 태평해 보이는 사람들이 웃는 얼굴이 아로새겨진 가면을 쓰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백색 소음이라고도 불리는 잔잔한 소음이 사방을 비단처럼 에워싼 공간에서, 저마다 딱 맞는 가면을 쓴 사람들은 무릎을 비비 꼬거나 발을 캐스터네츠처럼 까딱거리며 정다운 이야기에 심취했다. 그 가면 속에 민얼굴은 과연 어떤 형상일지 짐작이 전혀 안 갔다. 어쩌면 문둥병에 걸려 여기저기 흉측한 종기가 튀어나왔거나, 후드가 달린 망토를 뒤집어쓴 흡혈귀처럼 살기 어린 송곳니가 비죽 솟은 얼굴일지도 몰랐다.
내게 불행인지 행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조별 과제 준비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문밖으로 뛰쳐나올 필요성은 없었다. 내가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본 무도회 참가자들은 오른손을 슬며시 들고 흔들어 인사한다. 마치 꼬꼬마들이 갖고 노는 무선 조종 로봇이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듯 한 모양새였다. 당사자는 정작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게슴츠레하게 뜬 눈으로는 그들의 환영 인사가 프로그래밍이 잘 된 로봇 댄스팀의 삐걱대는 인사로만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경멸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내가 타고 온 시내버스 백미러에 살포시 내려앉은 먼지만큼도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억지로 활시위를 당기면 그 화살은 느닷없는 역풍을 맞아 내 흉부에 도로 꽂힐 뿐이었다. 얼음장처럼 차디찬 혈흔이 묻어나오는 그 화살을 억지로 부여잡고 뽑아내면서도 난 그들이 얼굴에 갖다 댄 고상한 가면에 멍하니 감탄했다. 저 가면을 당장 뺏어다가 등잔 밑에 숨겨버리고 싶을 만큼 마냥 부러웠다. 저 위선적인 표정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진 않았느냐고? 아니, 오히려 저 가면만 갖춘다면 내 인생은 연어처럼 제자리를 찾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흙탕물과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뒤섞인 하류의 풍경을 뒤로하고 발원지 꼭대기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당당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조별 과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질서정연하게 이뤄졌고, 덕분에 나도 잡념을 한 줌의 머리카락처럼 날려 보내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니, 사실 집중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나 같은 깍두기 하나 사라진다고 해도 충분히 이 과제의 종착점에 깃발을 꽂을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난 그들의 활약을 성의 없이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으니까. 내가 주목한 것은 그들의 가면이 짓고 있는 밝고 따사로운 웃음이었다. 그건 도트 무늬로 구현된 나의 투박한 표정과 감히 비견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조별 과제를 마친 지 몇 달이 흐른 지금, 나는 매일 매일 책상에 앉아 가면을 깎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밀린 공부를 위해서 오래전에 때려치웠던 기숙사에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엔 룸메이트와 무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만 했다. 어릴 적엔 어른들의 가식적인 표정을 끔찍이 멸시했던 내가 인제 와서는 억지도 웃는 방법이나 연구하고 있다니 정말 허탈할 노릇이었다. 톤즈 앤 아이(tones and I)의 노래 가사처럼 너무 잘난 그 친구들은 나와 맞지 않았지만, 최소한 나의 인생을 무난하게 운전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가면을 써야만 한다. 사회생활은 상연 횟수가 단 한 차례뿐인 즉흥 가면극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괘종시계의 시계추에 매달려 20여 년을 보낸 후에야 어렴풋이 깨달은 것 같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