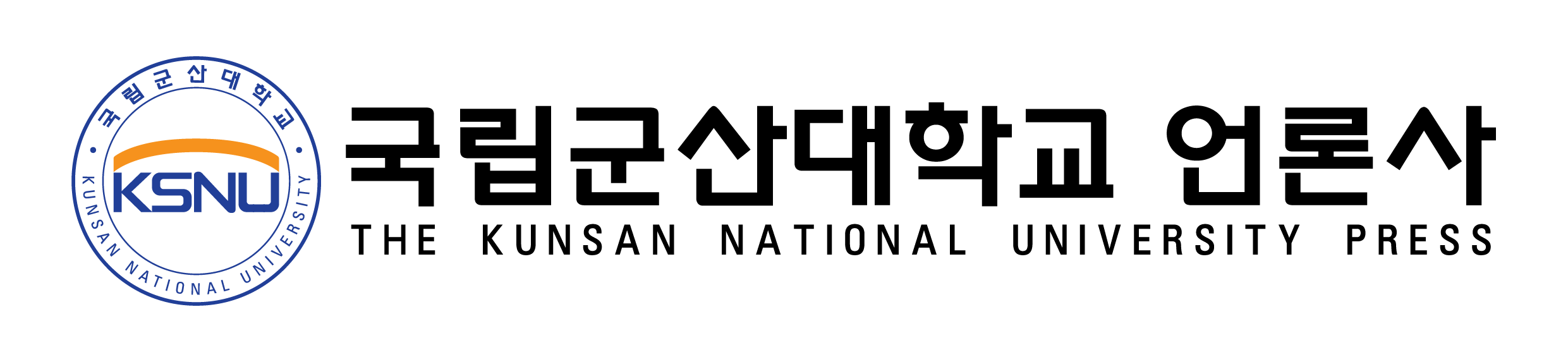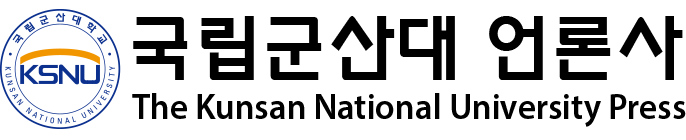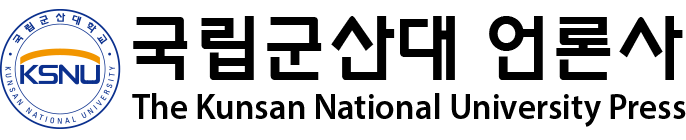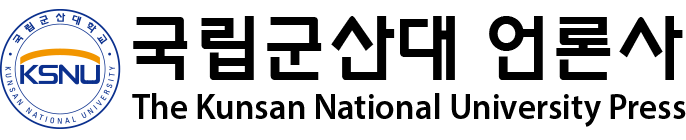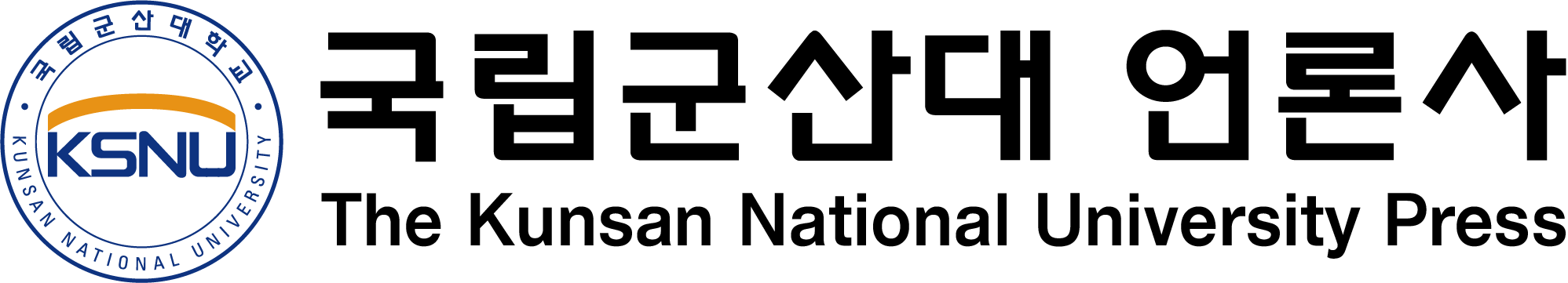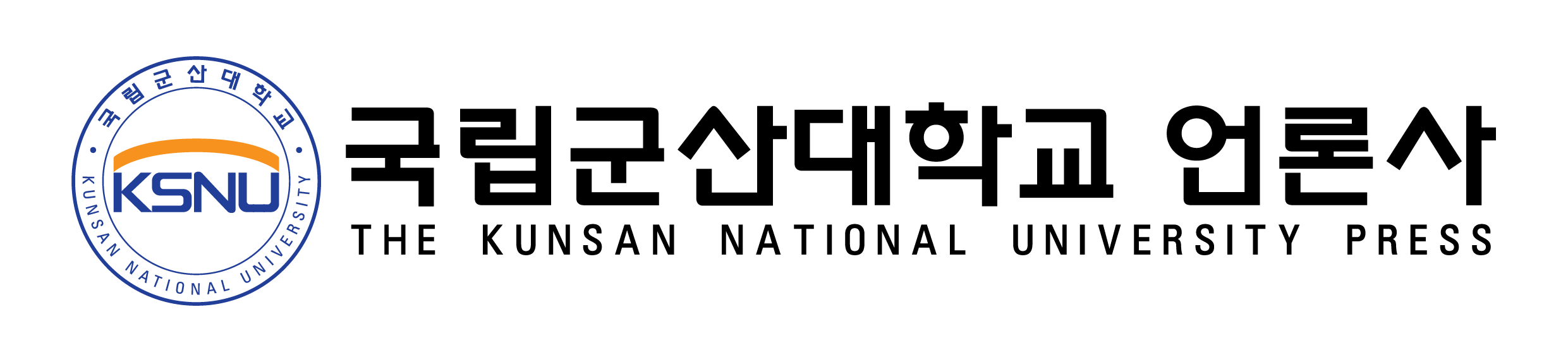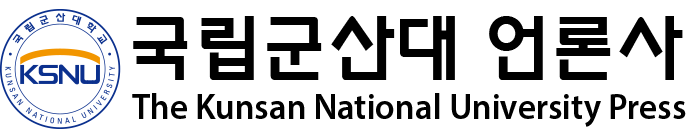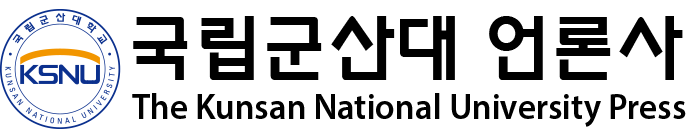포란
김신용
한 여름 내내 마당을 밝히던 꽃나무도 꽃들을 떨구고 난 뒤, 잎들도 기진한 듯 축 늘어져 있어
다가가 보니, 잎들마다 고치처럼 말려 말라가고 있다
저것도 마름의 형식? 꽃나무 아래 떨어진 잎을 주워 펴보니
그 속에도 마른 잎인 듯, 우화(羽化)가 벗어두고 간 허물이 후줄그레 놓여 있다
그러고 보니, 저 말린 잎들은 벌레의 산실(産室)이었던 것
알들의 방이었던 것
자신을 고치처럼 도르르 만 것은, 나뭇잎의 포란의 몸짓이었던 것
그것은 바구니에 담겨 강물을 떠내려가는 아기를 안아 올리는 손길 같은 것이어서
건너편 폐가도 잠시 환해 보인다, 저 빈집은 어떤 우화(羽化)가 벗어두고 간 것인지
벌써 가을이 와, 자신의 떨어질 때를 알아
그 잎으로 한 생의 집이 되어 준다면
배추나방 같은, 보잘 것 없는 것의 비가림막이라도 되어 준다면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 마름이-
낙하(落下)가-
허물이-
그 말라가는 힘으로, 알의 침실이 되어 주기 위해 잎주먹을 꼬옥 쥐었다면
물결주름 도르르 말린 잎으로, 촛불의 심지라도 돋우었다면
이 가을을, 조락(凋落)이 아니라 포란의 계절로 만들었다면
지난 여름, 그렇게 비가 많았어도 계절은 결국 가을이네요. 하늘이 참 높은 요즘입니다. 흔히 조락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이 작품이 포착하고 있는 대상 역시 축 늘어지거나 떨어져 내려 고치처럼 말라가는 꽃나무 잎들입니다. 그런데 돌돌 말린 이파리를 주워 펴보니 벌레의 허물이 그 속에 자리잡고 있다네요. 시인의 시적 상상력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말린 잎들은 벌레의 산실”이었으며 “알들의 방”이었다는 것이지요. 잎이 자신을 고치처럼 도르르 만 것 역시 “포란의 몸짓”이었다네요.
제철 지나 떨어져 내린 식물의 잎들이 둥글게 말리는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요. 굳이 설명하자면, 수분이 빠지며 점차 말라가면서 둥글게 말리는 것이지요. 또한 실제로 어떤 곤충들은 나뭇잎에 알을 낳고, 그 잎으로 알들을 잘 감싸 놓기도 한답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것을 ‘포란’이라고 규정합니다. 자연과학과는 다른 시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지점이지요. 식물의 잎이 ‘고치’처럼 도르르 말리는 것은 결국 “알의 침실이 되어 주기 위해 잎주먹을 꼬옥 쥐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아름다운 연민의 시선은 요즘 농촌에 흔한 ‘폐가’마저도 “어떤 우화가 벗어두고 간 것”으로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인식처럼, 실제로 ‘마름’과 ‘낙하’와 ‘허물’이 그렇게 뿌듯한 것만은 아니지요. 그것은 텅 빈 자리에 대해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쓸쓸한 인식의 소산이기도 하니까요. 둥글게 말린 잎에서 출발하여 폐가에까지 이르고 있는, 그 텅 빈 자리의 쓸쓸함이 이 작품의 여운을 더하게 합니다. 연민의 시선과 포옹의 자세가, 이 가을을 그야말로 조락의 계절이 아니라 포란의 계절로 바꾸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