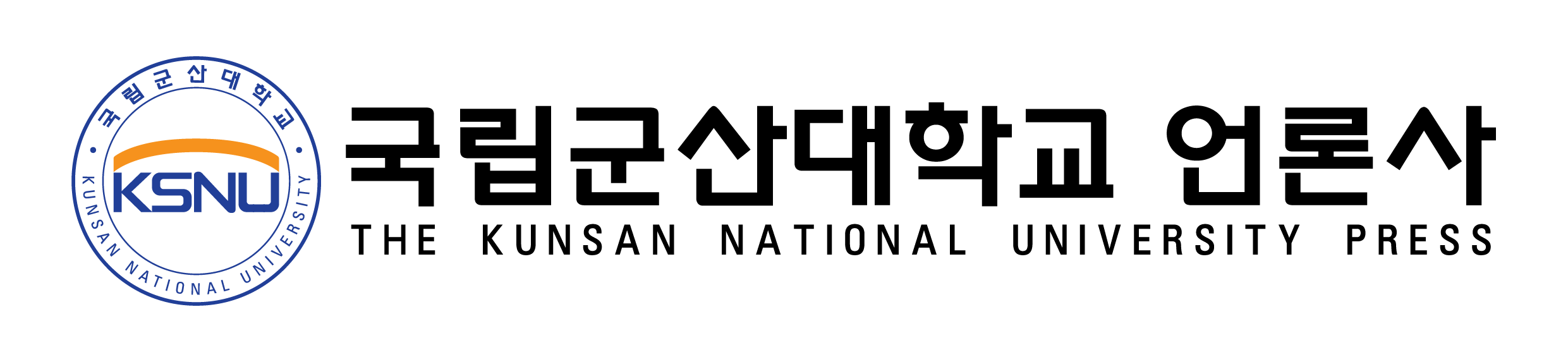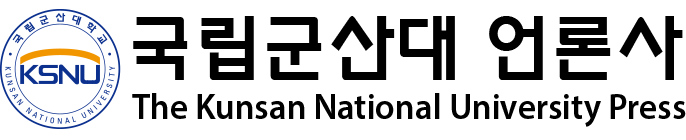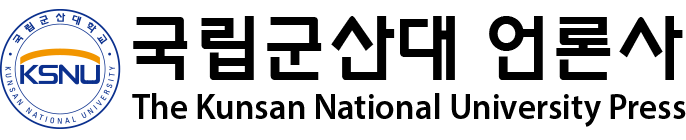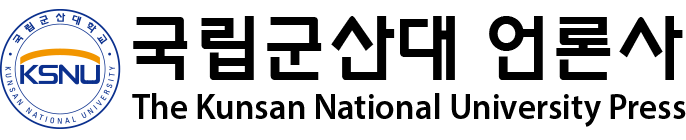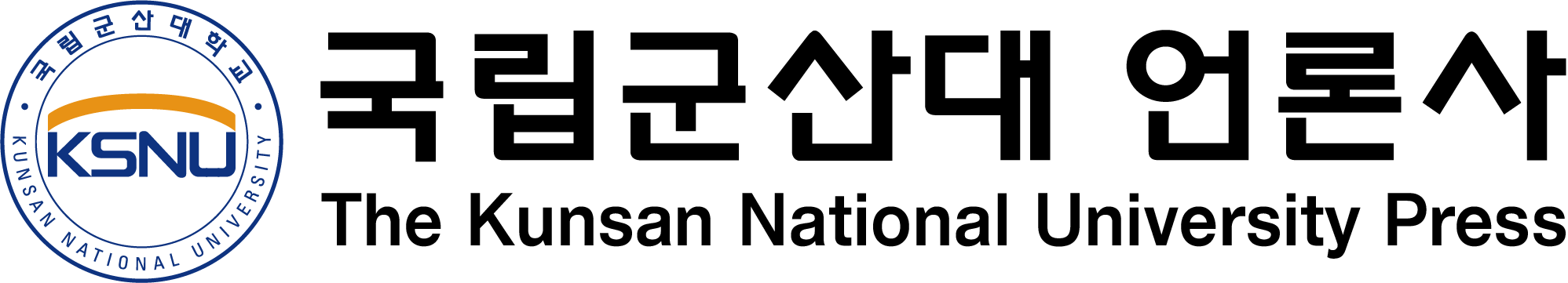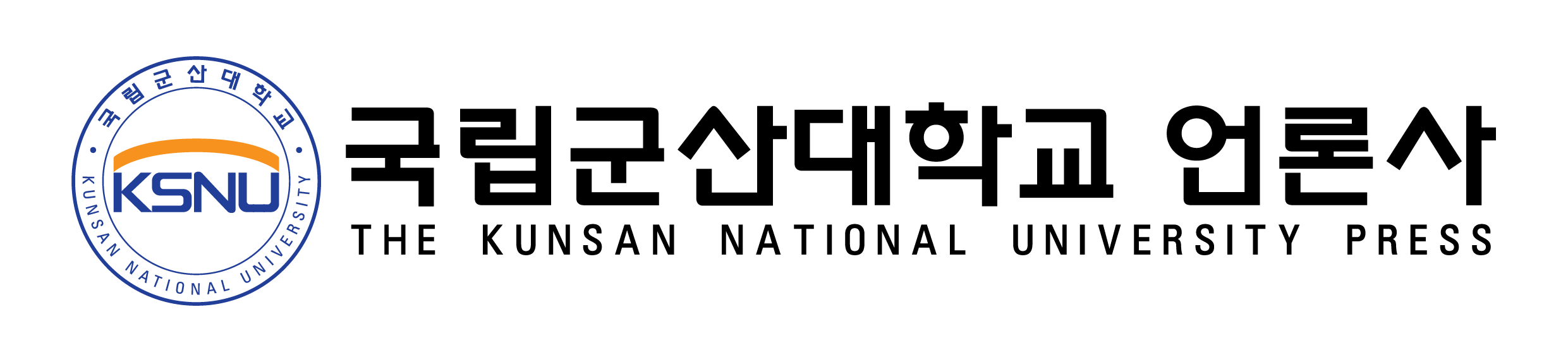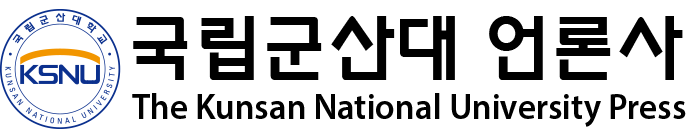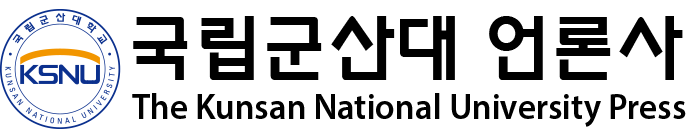사소한 문제들 - 안보윤
문학동네(2011)
깊은 밤, 가로등마저 고장 난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수없이 오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끊긴 골목이 오늘따라 음산하게 느껴진다. 다행히 저만치 보이는 모퉁이의 가로등은 빛을 밝히고 있다. 어쩐지 오싹해진 당신이 모퉁이의 가로등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음을 재촉할 즈음, 긴 그림자를 늘어뜨린 누군가(혹은 무언가)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다.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선 당신과는 달리, 긴 그림자의 누군가(혹은 무언가)는 당신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온다.
자,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긴 그림자의 누군가(혹은 무언가)가 누구(혹은 무엇)일 때 공포감이 극대화될까? 드라큘라나 좀비 같은 몬스터? 늑대나 호랑이 같은 맹수? 그도 아니면, 에일리언 같은 우주생명체? 누구(혹은 무엇)라도 좋다. 상상 가능한 모든 대상들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보자. 수많은 답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중 다수는 나와 같은 답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사람’이다. 흔히들 하는 ‘세상 참 무섭다’라는 말에서 세상은 사람에 다름 아닐 것이다. 사람은 괴수나 맹수보다 동류인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입고는 하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틈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을 울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분노케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던가 말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베인 상처들을 보듬어주는 것 역시 사람이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입은 상처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치유 받는다.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
||
두식은 아영의 다리에 짓눌린 자신의 몸이 의외로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에 놀란다. 꿰맨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두식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닿는 이 체온이 기쁘다.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을 맞대는 것이 한없이 기쁘다. 한동안 잊고 있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갈구해왔던 이만큼의 체온. 고작 이만큼, 이만큼의 체온을 원했을 뿐인데. (159쪽)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36.5도. 자신과 똑같은 체온을 가진 다른 이의 체온과 그 체온 속에 담긴 위로, 그거면 족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아영과 두식은 물론 황순구와 성현마저도 소통에 실패하고 관계에 상처 입은 피해자들일지도 모른다. 어디 그들뿐이겠는가. 수많은 아영과 두식들을, 불길하고 불편한 모든 존재들을 애써 외면한 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당신과 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저마다 끊임없이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해야 할 테고, 그 과정에서 상처 주고 상처 입기를 반복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지레 겁을 먹지는 말자. 두식에게 아영이 그래주었듯, 여러분의 상처를 기꺼이 감싸줄 체온이 세상 어딘가 반드시 존재할 테니 말이다. 우리는 그저 살아갈 일이다. 그렇게 살아가다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만나 체온을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테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