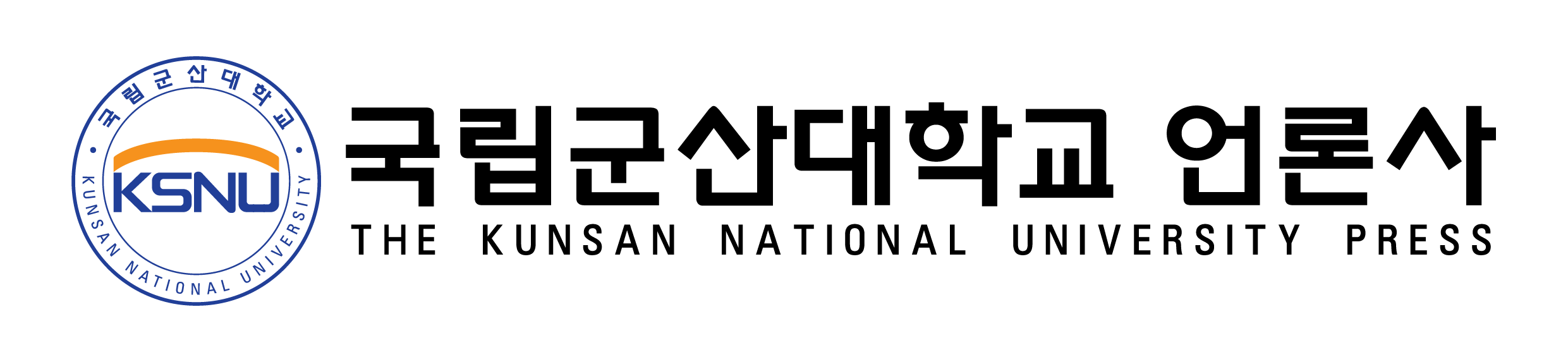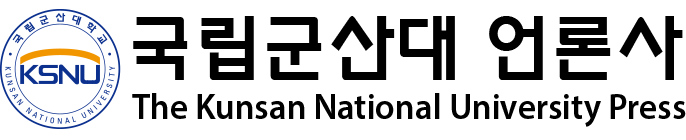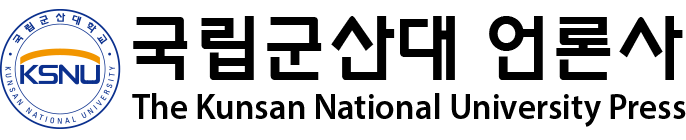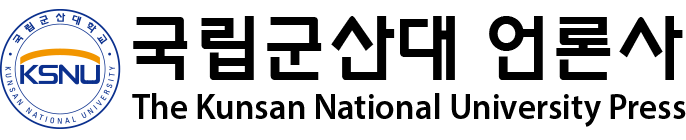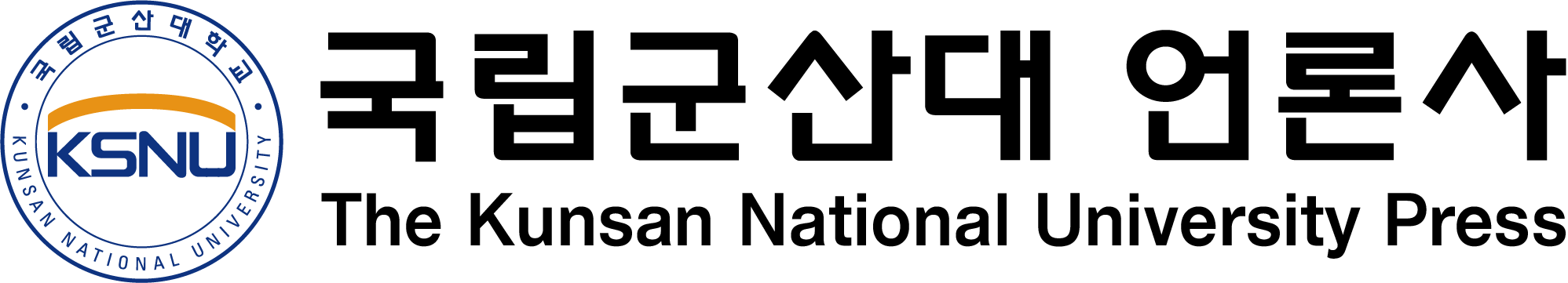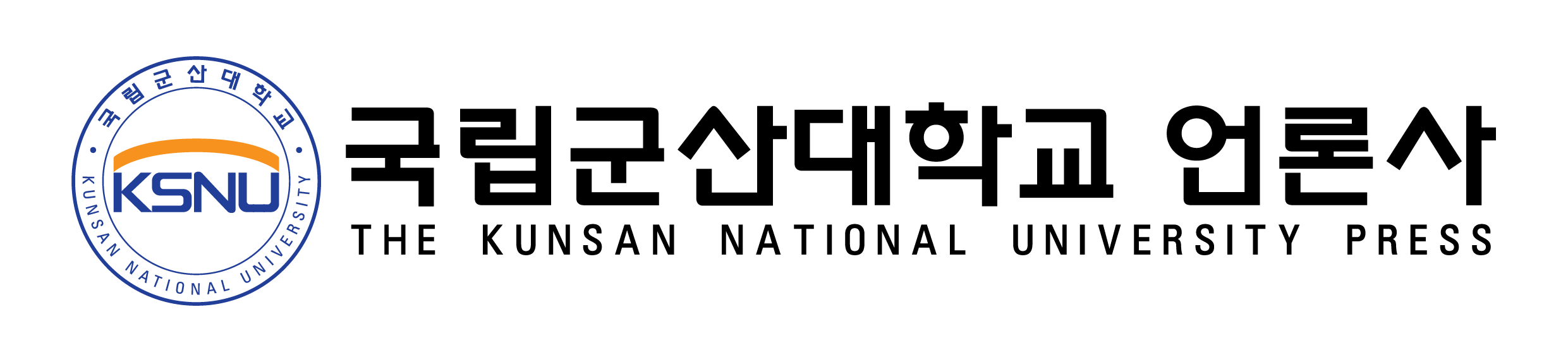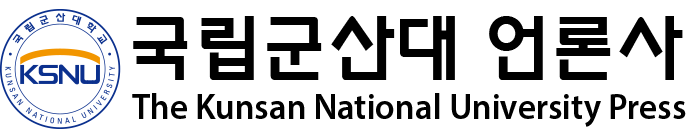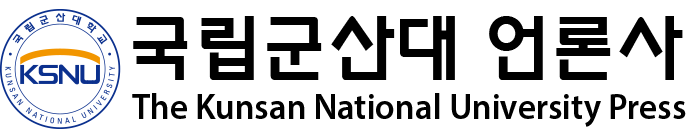신문에 남을 나의 열정
두 달차 신입 수습기자의 수습月기
과거의 나는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심에 하나의 문장을 붙잡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고쳐나가고는 했다. 그런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우연한 계기로 언론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레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난보다는 비판하는 똑똑한 여론을 만드는 언론인이 되고 싶었고 ‘더 잘, 좋은 글을 써야지, 나의 글을 써야지, 나의 글을 남겨야지.’ 하며 언론사의 지원서를 손에 쥐었다. 어디든 기자라는 직업은 무척이나 힘들다던 주변에 만류를 제쳐놓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해봐!’하는 20살 나의 패기가, 지금의 이 글을 낳았다.
이런 나도 언론사에 지원하기 전까지 기사와 마감 시간에 허덕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지원을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새 수습기자가 된 나는 나의 글이 신문에 실리는 것 자체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떤 안건을 낼지 고민하고 무슨 안건을 맡았을 때 나의 글이 빛을 발할 것인지 고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대학 곳곳에서 기획되고 있는 행사들을 타 학우들보다 빠르게 접하고 그것을 나의 기사로 적어 나갈 때에 뿌듯함이야말로 언론사의 기자이기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다.
모든 일이 쉽지는 않았다. 기사보다는 논설문을 더 많이 써온 내가 기사를 쓰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중립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모두의 시선에서 글을 써야 했고 수정을 하는 데에도 시간을 쏟아야 했다. 처음 기사를 작성할 때는 수차례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치기도 했지만, 함께 기사를 쓰는 선배 기자들의 조언과 여러 도움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전보다 필력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나의 글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나의 글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웠다. 바로 ‘글은 망설이고 고민해야 잘 써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고 나대로 적을 때 가장 예쁜 글이 된다.’는 것이다.
 |
| ▲홍유정 수습기자 |
아직 들어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수습기자이지만, 나의 글이 담긴 신문이 쌓여간다는 생각으로 벌써 가슴 한편이 가득 채워진 것만 같다. 앞으로 더 많은 글을 접하고 쓰게 될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모으고 나의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주어질까? 언론사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는 학생들이 있다면 나의 수습月기를 통해 언론사의 일원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언론사에서 얻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학우도 느꼈으면 하는, 모두가 지금껏 품어 온 열정을 잃지 않고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