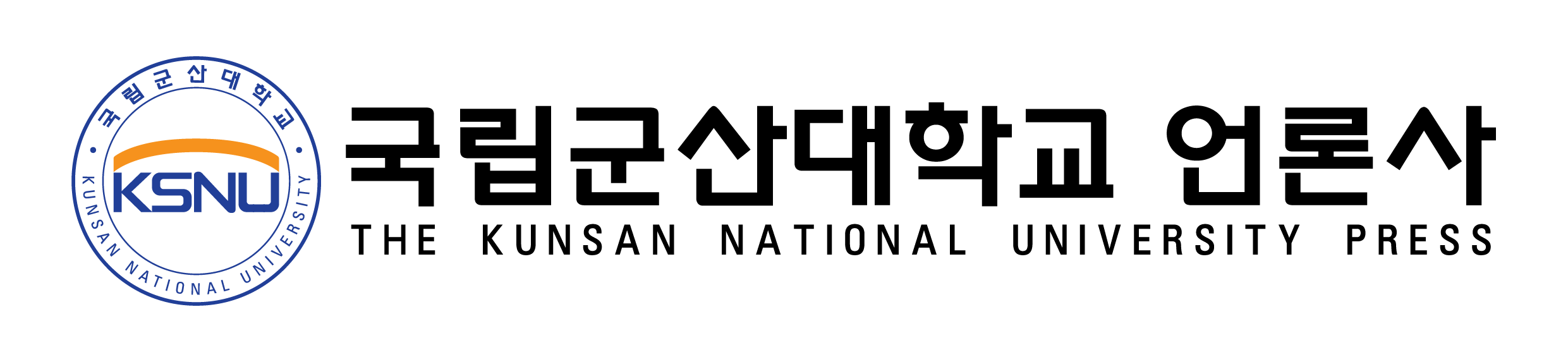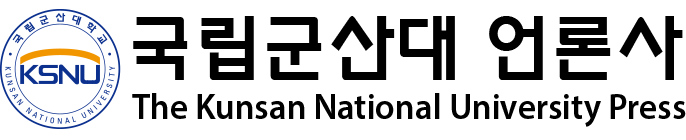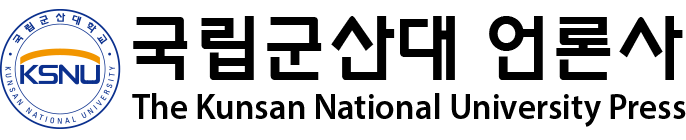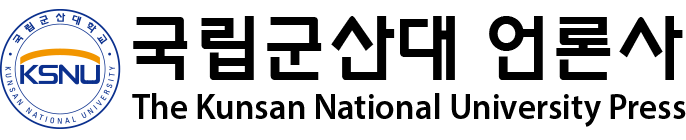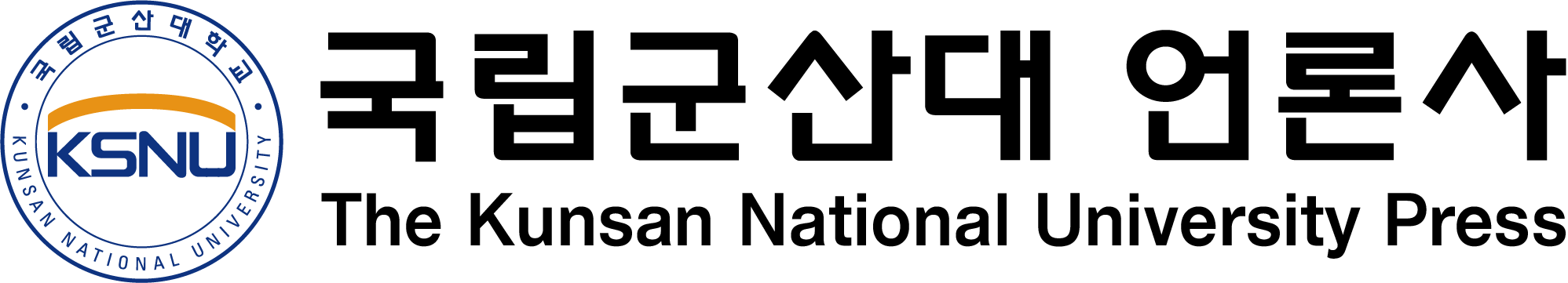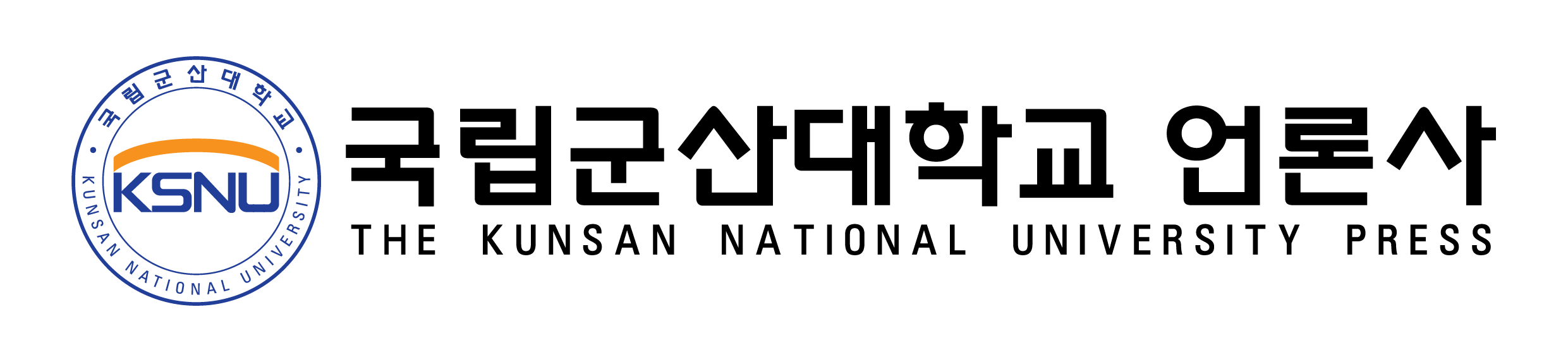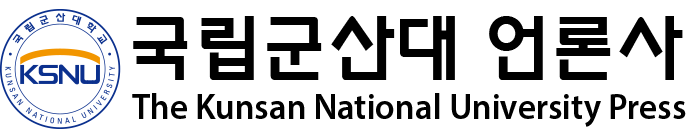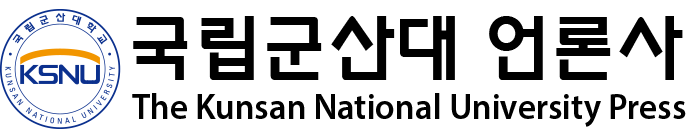빗소리 듣는 동안
안도현
1970년대 편물집 단칸방에
누나들이 무릎 맞대고 밤새 가랑가랑 연애 얘기하는 것처럼
비가 오시네
나 혼자 잠든 척하면서 그 누나들의
치맛자락이 방바닥을 쓰는 소리까지 다 듣던 귀로, 나는
빗소리를 듣네
빗소리는
마당이 빗방울을 깨물어 먹는
소리
맛있게, 맛있게 양푼 밥을 누나들은 같이 비볐네
그때 분주히 숟가락이 그릇을 긁던 소리
빗소리
삶은 때로 머리채를 휘어 잡히기도 하였으나
술상 두드리며 노래 부르는 시간보다
목 빼고 빗줄기처럼 우는 날이 많았으나
빗소리를 모아 둔
비 온 뒤의 연못물은 젖이 불어
들녘을 다 먹이고도 남았네
내 장딴지에는 살이 올라 있었네
먼저 ‘편물집’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편물집’ 혹은 ‘편물점’이라는 간판을 보기도 쉽지 않은 요즘이기 때문입니다. ‘뜨개점’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되겠네요. 편물집은 뜨개옷이나 뜨개 장갑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었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60년대나 70년대 당시만 해도 손뜨개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공예 작업의 하나였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편물집은 그러한 손뜨개물을 팔기도 하고 일감을 공급해주기도 하는 상점이었습니다.
낭만적인 빗소리에 섞여 1970년대 편물점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서정의 한 방법이겠네요. 동네 누나들은 편물집 단칸방에 모여 손뜨개를 하며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곤 했답니다. 물론 ‘연애 얘기’가 단연 흥미로웠겠지요. 그래서 ‘가랑가랑 연애 얘기하는 것처럼 / 비가 오시네’라는 은근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동네 누나들이 벌이는 수다를 화자는 잠든 척하며 엿듣습니다. 잠든 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요. 동네 누나들이 수줍어서일 수도 있고, 누나들이 끼어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누나들에 대한 은근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잠든 척하면서 누나들의 수다와 함께 듣는 빗소리는 썩 근사했겠네요. 마치 ‘마당이 빗방울을 깨물어 먹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네요. 또한 빗소리는 누나들이 새참으로 밥을 비벼먹는 장면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딱히 간식거리가 없던 그때, 남은 밥을 통째로 양푼 그릇에 넣고 열무김치와 고추장으로 슥슥 비비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빗소리가 마치 ‘분주히 숟가락이 그릇을 긁던 소리’ 같다네요.
하지만 누나들의 수다에 섞이는 빗소리를 듣는 것처럼 세상이 서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삶이란 과연 ‘때로 머리채를 휘어 잡히기도’ 하고, ‘노래 부르는 시간’보다 ‘목 빼고 빗줄기처럼 우는 날’이 많은 법이지요. 이러한 삶의 비의(秘意)를 인식하려면 아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자라야 할 것입니다. 빗소리를 모아 연못물이 불어나듯, 화자의 장딴지에 살이 오르듯 말입니다. 이 작품에서 빗소리는 결국 그저 낭만적인 서정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인식의 깊이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제 몇 번 비가 오면 올해도 봄빛이 완연하겠지요.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