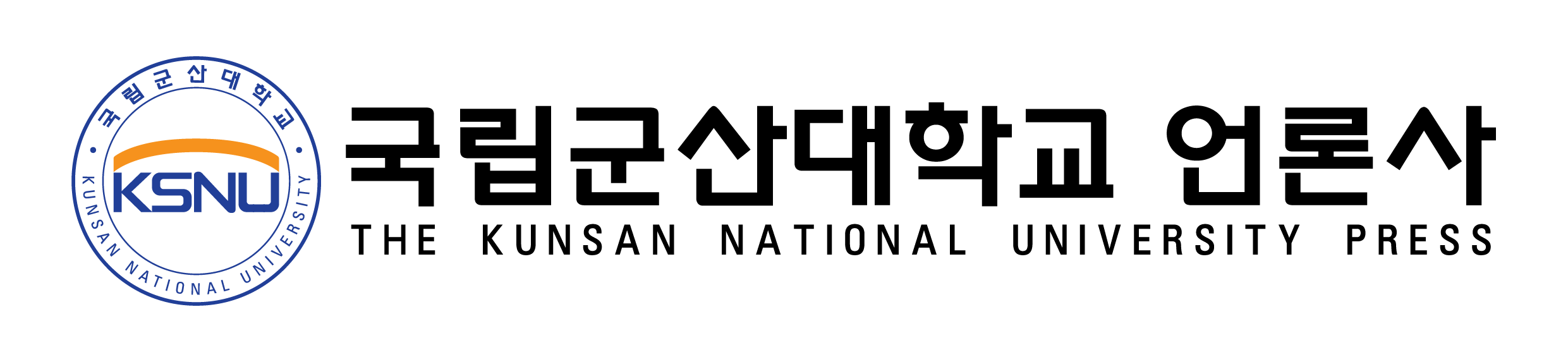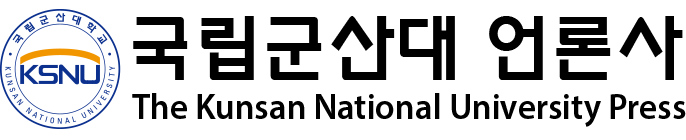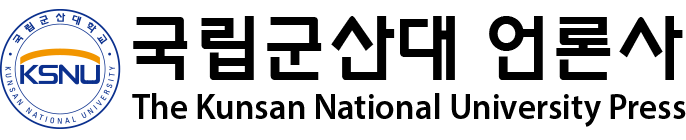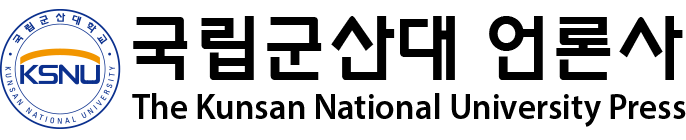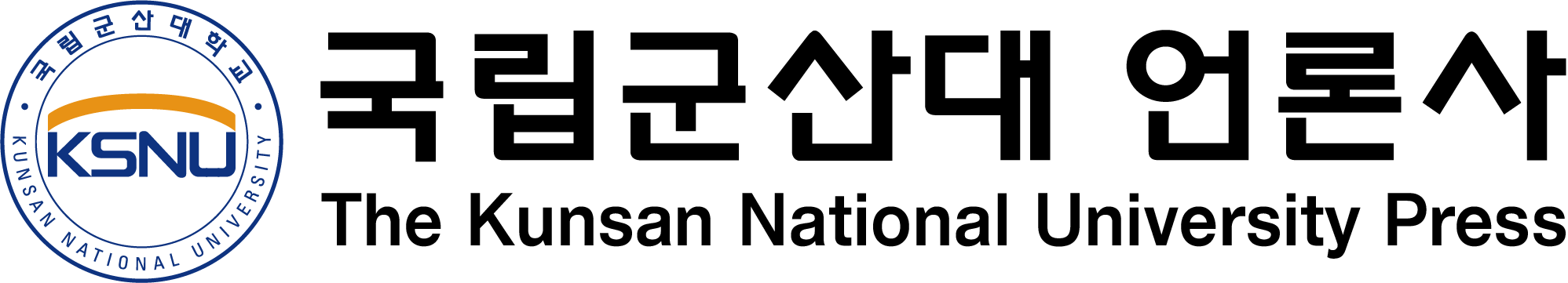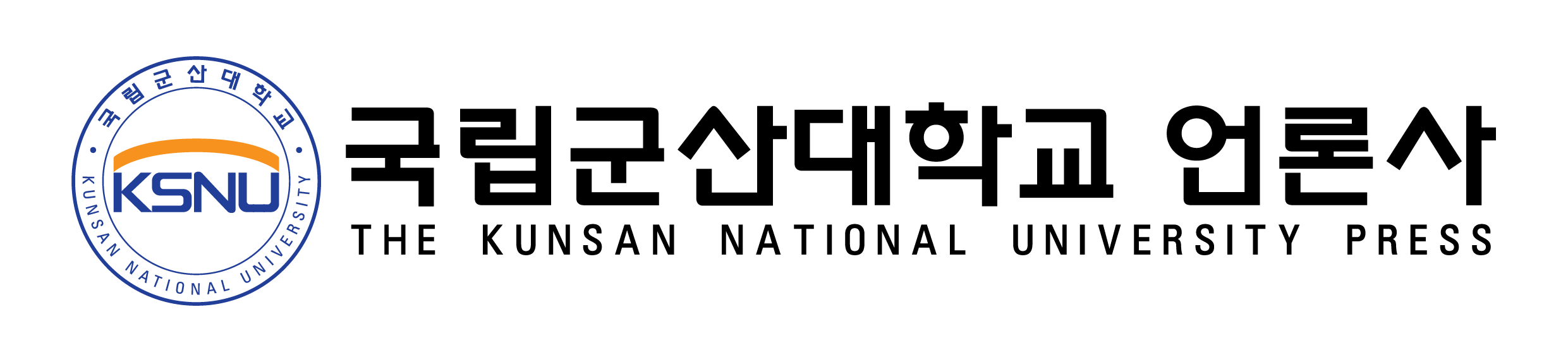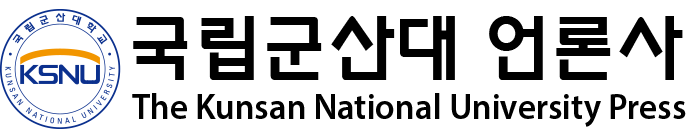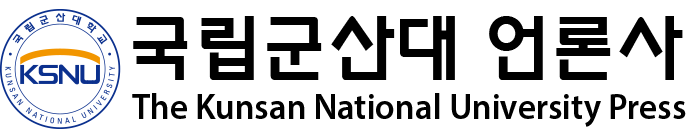봄날
봄날
송찬호
봄날 우리는 돼지를 몰고 냇가에 가기로 했었네
아니라네 그 돼지 발병을 했다 해서
자기의 엉덩짝 살 몇 근 베어 보낸다 했네
우린 냇가에 철판을 걸고 고기를 얹어놓았네
뜨거운 철판 위에 봄볕이 지글거렸네 정말 봄이었네
내를 건너 하얀 무명 단장의 나비가 너울거리며 찾아왔네
그날따라 돼지고기 굽는 냄새 더없이 향기로웠네
이제, 우리들 나이 불혹이 됐네 젊은 시절은 갔네
눈을 씻지만 책이 어두워 보인다네
술도 탁해졌다네
이제 젊은 시절은 갔네
한때는 문자로 세상을 일으키려 한 적 있었네
아직도 마비되지 않고 있는 건 흐르는 저 냇물뿐이네
아무려면, 이 구수한 고기 냄새에 콧병이나 고치고 갔으면 좋겠네
아직 더 올 사람이 있는가, 저 나비
십 리 밖 복사꽃 마을 친구 부르러 가 아직 소식이 없네
냇물에 지는 복사꽃 사태가 그 소식이네
봄날 우린 냇가에 갔었네 그날 왁자지껄
돼지 멱따는 소린 들리지 않았네
복사꽃 흐르는 물에 술잔만 띄우고 돌아왔네
계절은 어김없어서 또 세상은 봄날의 정취로 가득합니다. 햇살 따스한 봄날이면 다정한 사람과 함께 어디 야유회라도 다녀오고 싶은 춘정(春情)이 솟기도 하겠지요. 이 작품 역시 봄날 냇가로 소풍을 나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설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봄볕은 뜨거운 철판 위에 지글거렸고, 흰 나비가 날아다녔으며, 고기 굽는 냄새는 향기로웠고, 냇물에 지는 복사꽃은 사태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둘째 연의 “정말 봄이었네”라는 감탄은 그 풍광과 정취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정황과 달리 작품의 속내는 지극히 쓸쓸하고 무상한 느낌을 주네요. 왜 그럴까요.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듯이, 봄이라는 계절은 양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오히려 덧없는 젊음과 무상한 세월을 되새기게 합니다. 봄은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을 다시 소생하게 하고 생명감을 고양시켜주기도 하는 계절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문득 사라져버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봄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한번 지나간 세월과 젊음은 결코 다시 오거나 돌이켜지지 않아 세월의 속절없음을 더하게도 합니다. 셋째 연과 넷째 연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이제 젊은 시절은 갔네”라는 직설적 탄식도 이러한 심사를 반영합니다.
작품 속에서 화자는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었다며, 눈을 씻지만 책이 어두워 보이고, 술도 탁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식은 “한때 문자로 세상을 일으키려 한 적” 있었던 질풍노도의 시절이 이제는 가고 없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지금은 세상의 속된 일상에 마비되고 무감각해져 대충 살고 있다는, 쓸쓸한 회한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과연 “아직도 마비되지 않고 있는 건 흐르는 저 냇물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복사꽃 흐르는 물에 술잔만 띄우고 돌아오더라도,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 야유회라도 가서 봄날의 정취를 흠뻑 느껴볼 일입니다. 돌아오면 더 쓸쓸해지겠지만 말입니다. 그게 그나마 덧없는 젊음과 무상한 세월을 견디는 방식일 테니까요.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