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 간다
봄날 간다
김명인
겨울을 나면서 어느새 봄 햇볕이 따스해
그대와 나는 거기 언덕 위로
봄소풍 갔드랬습니다, 겨우내 竹친
생활이 하 비장해서
막막하기로야 나무들도 어디 뒷골목쯤에 차린
망명정부 같았습니다만
저 딱딱한 각질 속에
이렇게 부드러운 새 살을 감추고 있었다니!
일찍 온 해방은 여기저기 서리바람 속으로 연한
잎들을 삐쭉삐쭉 눈 틔우게도 하였습니다
오, 봄햇살이 번지는 동산
작년의 낙엽 위에 앉아 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 여자 셋이서
노을을 등진 채, 북, 장고, 꽹과리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님을 봐야 별을 따지, 님을 봐야 별을 따지
봄이랬자, 아직 만나야 할 님을 못 만난
사연들이 저렇게 많아
우리네 인생 속내까지 얼음 잡힐 때, 그대 님들은
어디 강남에라도 함께 망명계시는가요?
해방은 이미 한 세기 다해 저무는데, 하늘엔
따지 못한 별들만 총총 널렸드랬습니다
제목처럼,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가버렸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제목으로 가는 봄의 쓸쓸한 정취를 노래한 작품이 참 많지요. 어디 문학뿐인가요. 이영애와 유지태가 주연한 영화 ?봄날은 간다?도 있고, 대중가요 중에도 ?봄날은 간다?가 있지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로 시작되는 노래 말입니다. 아니 세대가 다르군요. 김윤아가 부른, 또 다른 노래 ?봄날은 간다?도 있지요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이라고 말입니다. 따스한 봄날이 왜 아릿아릿 쓸쓸할까요.
봄이 되면 우리는 겨우내 죽친 생활을 접고 들로 산으로 소풍을 다녀오곤 합니다. 그 겨울의 막막함을 ‘망명정부’에 빗대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봄이란 말하자면, 망명정부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 즉 ‘해방’과 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때로 봄소풍 삼은 야유회에서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음주가무에 한창인 상춘객들을 만나는 일도 흔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님을 봐야 별을 따지, 님을 봐야 별을 따지”라니요. 노랫가락이 새삼스럽습니다. 세상에는 만나야 할 ‘님’을 못 만난 사연들이 참 많아서, 봄날의 노랫소리는 더욱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네 인생은 아직도 속내까지 얼음 잡히는 겨울일 것이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님’들은 여전히 어디 따뜻한 강남에라도 망명가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는 듯 가버리고 마는 계절, ‘봄’의 속절없음을 이 작품은 우리네 인생살이와 견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절없기로 치면 어찌 봄날뿐이겠습니까. “봄이랬자” 가버리고 나면 그뿐이겠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렇게 계절은 속절없고 하늘에는 따지 못한 별들이 총총 널려 있어서, 오히려 삶이 그나마 안타까이 아름다운 건 아닌지요. 따지 못했다고 해서 별이 반짝거리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더 늦기 전에 봄소풍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야말로 꽃피고 새우는 호시절을 바로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년에도 봄은 또 어김없이 오겠지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봄날’이 아마 우리 삶의 가장 따스한 ‘봄날’일지도 모릅니다. 봄소풍 다녀오시면서 날이 저물면, 하늘에 총총 따지 못한 별들도 한번쯤 오래오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시인, 원광대 교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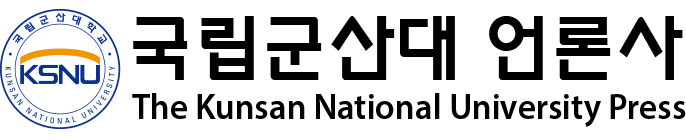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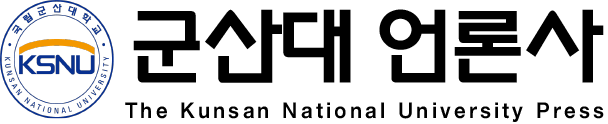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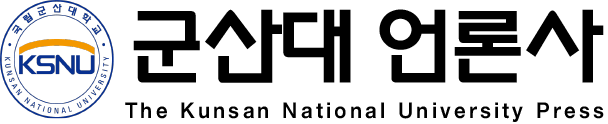
![국립군산대 신문 559호 [신년호] (2024-01-04)](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2024/02/atbhot_202402140527.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