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 다리로 보는 1930년대 군산 내항
군산이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대표적인 도시로 인식되는 것은 군산 내항의 역할에서 기인한다. 군산을 개항하고 항구 개발을 처음 시작한 대한제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군산 내항은 일제에 의해 쌀 수탈을 위한 항구로 개발되었고 창고와 철도 등의 시설이 지어지면서 그 모습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지금 군산 내항에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시설물은 그 일부가 남아있는 뜬 다리, 바다에 접해 있는 호안과 철도의 일부가 전부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와 같은 당시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군산항을 개발하는 이른바 축항공사는 대한제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계속되었다. 일제에 의해 총 4차례의 축항공사가 실시되었고 현재의 내항의 윤곽이 형성된 것은 제3차 축항공사가 마무리된 1932년이다. 이때 현재 내항에서 볼 수 있는 호안이 만들어졌다. 군산 내항을 만들기 위해 해안을 매립하는 공사가 계속되었고 조성된 매립지가 침식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호안이다. 내항의 호안은 사각뿔 모양의 돌을 눕혀 차곡차곡 쌓아 조성한 것이다. 외부에서 보면 돌이 마름모꼴로 쌓여 있고, 쌓여진 전체적인 면이 오목한 곡면을 이루는 일본 석축에서 주로 발견되는 형식이다.
쌀 수탈을 위한 대형 선박이 군산 내항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매우 큰 서해안의 자연적인 특성을 극복해야만 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뜬 다리이다. 제3차 축항공사 이전까지는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때 처음으로 3기의 뜬 다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항구에서 배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다리 모양의 구조물을 일반적으로 잔교(棧橋, Pier)라고 한다. 뜬 다리는 부잔교(浮棧橋, Floating Pier)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배를 대기 위해 물에 띄워 길게 연결한 함체(Pontoon)에 육지에서 이어지는 다리를 연결한 구조이다.
현재 남아있는 뜬 다리가 1930년대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당시 만들어진 온전한 뜬 다리 1기는 육지에서 이어지는 2개의 다리와 그 다리에서 연결된 긴 함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재 군산 내항에는 반쪽짜리 뜬 다리 3기가 남아있는 셈이다. 현대 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레일러에 실려 온 컨테이너가 대형 크레인에 의해 화물선으로 옮겨진다. 뜬 다리는 크레인처럼 화물을 직접 옮겨 싣는 구조물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육상의 물류와 해상의 물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하는 구조물이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근대기에도 항구는 육상 교통과 해상 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내륙 운하를 통한 물류의 운송이 발달한 북유럽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벨기에의 앤트워프, 폴란드의 그단스크와 같은 국제적인 항구들이 내륙 운하 사이의 연결지점이 되기도 바다의 해상 교통과 내륙 운하를 연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산을 포함한 많은 근대기 항구 도시의 발달은 철도의 계통 및 확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군산항의 축항공사는 한편으로 항구 자체를 조성하는 공사이면서 동시에 철도를 연장하고 확장하는 공사이기도 하였다.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군산 내항에는 1931년 별도의 철도역인 ‘군산항역’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 역은 군산항선 영업이 중지된 1949년 폐쇄된다.
군산 내항에 남아있는 철도와 뜬 다리 사이에는 지금은 사라진 거대한 창고들이 있었다. 철도를 통해 내항으로 운반된 쌀이 창고에 쌓여지고, 다시 뜬 다리를 통해 화물선으로 옮겨지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군산 내항은 뜬 다리가 나란히 설치된 긴 호안과 그것에 평행하게 지어진 거대한 창고, 그리고 길게 연결되는 선형의 철도가 서로 평행하게 겹겹으로 배치되고, 그 너머로 원도심이 펼쳐진 모습이었다. 현재 이곳에는 진포해양테마공원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들어섰고, 그 주변으로 과거의 건축물과 시설들에 대한 정비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깨끗하고 보기 좋게 바꾸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과하여 과거 군산 내항의 흔적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까지 지우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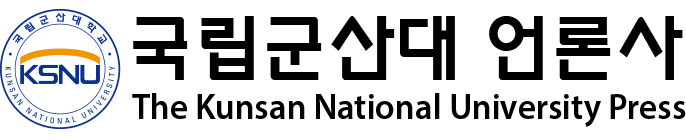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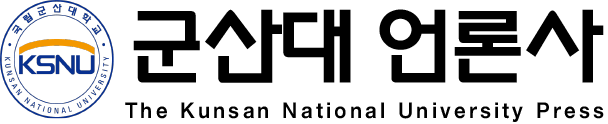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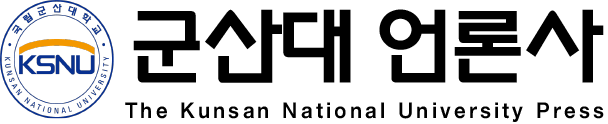
![국립군산대 신문 559호 [신년호] (2024-01-04)](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2024/02/atbhot_202402140527.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