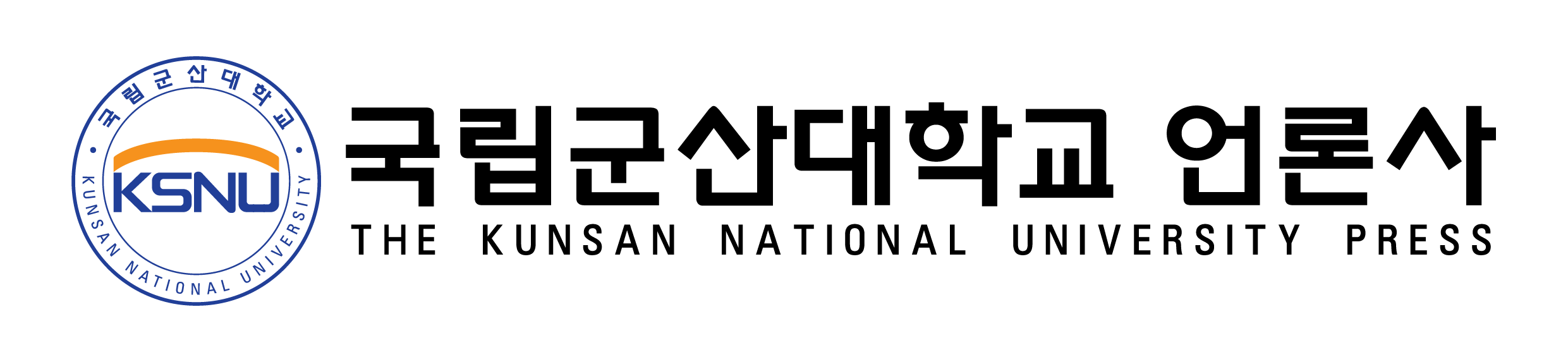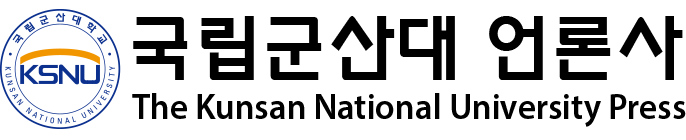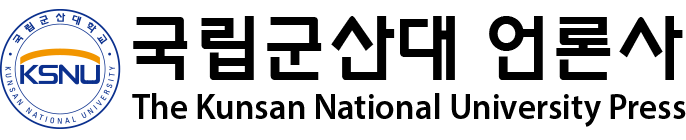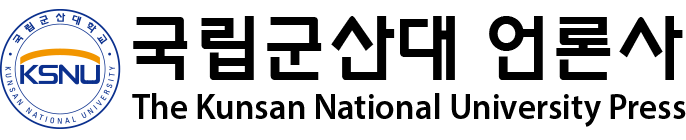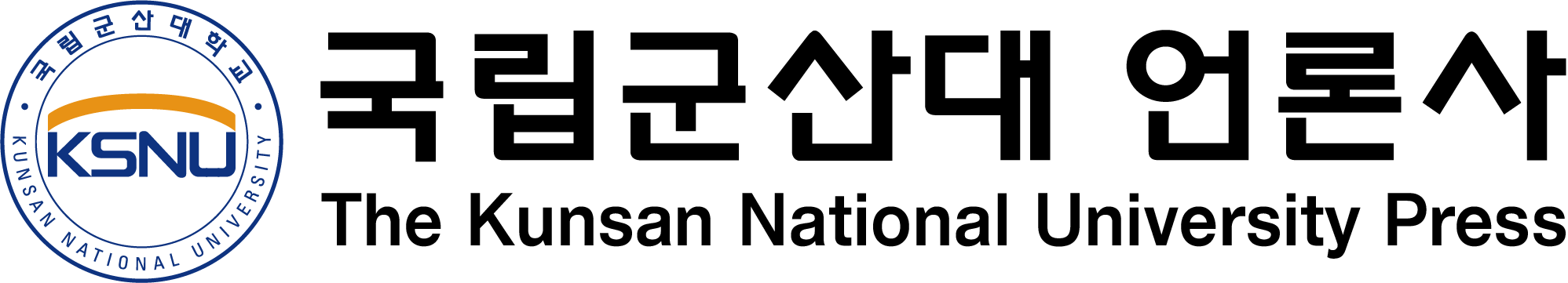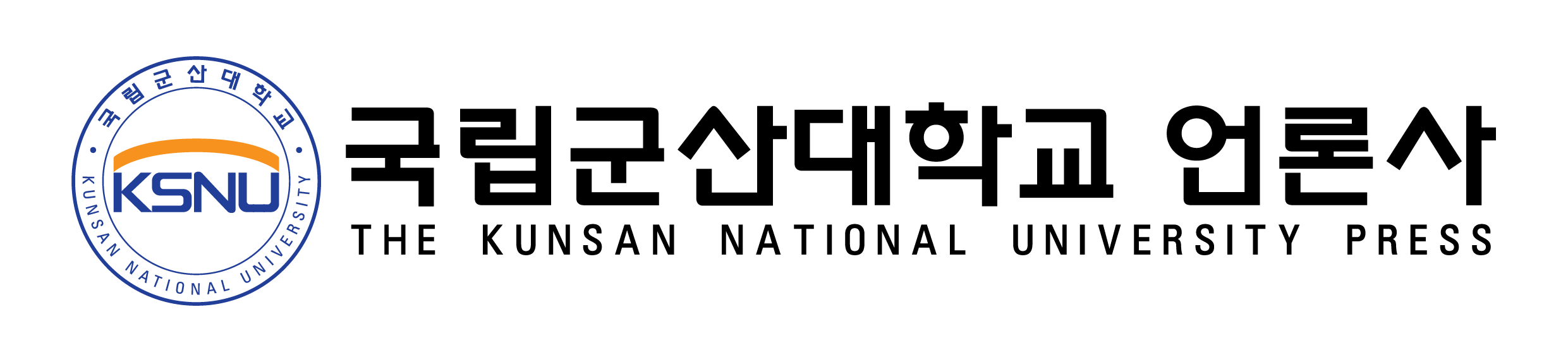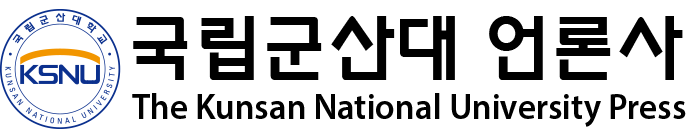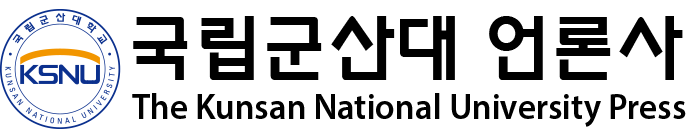사랑 영화에서 장애물은 축복이다. <로미오와 쥴리엣>에서 그들이 서로 원수 가문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면 이야기는 전설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장애물이기에 영화의 격정적 감동은 배가된다.
<타이타닉>의 잭과 로즈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엄격히 다른 계층과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좁은 배 안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구분이 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장애물을 단숨에 뛰어넘는다. 마치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까지인지 실험하려는 듯 장애물은 점점 더 높아지고 까다로워진다.
2010년을 휩쓸었던 <아바타>도 그런 점에서 장애물 너머의 사랑이야기이다. 나비족과 인간의 사랑이 전반에 깔려 있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업 사이드 다운>은 사랑과 장애물이라는 설정을 매우 시각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물을 보이지 않는 상징이 아니라 보이는 장벽으로 그려냈다는 의미이다.
<업 사이드 다운>의 장애물은 중력으로 설명된다. 마치 자석의 엔극과 에스극처럼 서로 다른 중력의 법칙에 의해 살아가는 두 남녀가 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중력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아 위쪽은 상류계층이고 아래쪽은 하류계층이다. 계층적 구분, 계급적 질서라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시각화한 셈이다.

말하자면 <업 사이드 다운>은 중력을 소재로 활용한 동화적 세계를 보여준다. 애초부터 이 영화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중력의 세계와는 다른 공간이 그려진다. <반지의 제왕>을 보듯 가상의 공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계를 수긍할 수 있다.
<업 사이드 다운>의 내용은 그다지 새로울 바가 없다. 위 쪽의 중력에 의존해사는 상류계층의 여성과 아래 쪽의 중력으로 살아가는 하층 계급의 남성이 만나 사랑하는 이야기니 말이다. 중력을 장애물로 전제한 설정 자체가 새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각적으로 극명한 이 분리를 어떤 마술적 방식으로 극복해 내느냐 이다. 영화가 선택한 방식은 말그대로 마술적이다. 두 중력 공간을 서로 오가는 꿀벌이 따온 벌꿀로 중력을 이기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방식으로 말이다. 모든 사랑이 마법이고 주술이라는 듯 <업 사이드 다운>은 그 주술적 힘을 전폭적으로 활용한다.
<업 사이드 다운>의 관람 포인트는 따라서 이야기의 새로움이라기 보다는 다른 중력장을 표현해내는 시각적 즐거움에 있다. 마치 <인셉션>에 등장하는, 꿈 속에서 반으로 접힌 도로처럼 환상적인 공간이 촬영을 통해 재현된다.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반으로 접힌 듯 마주보는 세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화가 선사할 수 있는 즐거움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환상이라면 <업 사이드 다운>은 그런 환상을 채워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볼거리라면 칸느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던 커스틴 던스트의 매력이다. 상류 계층의 여성으로 등장하는 커스틴 던스트는 스파이더 맨 키스 이후 인상적인 키스신을 보여준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 중요한 사랑의 원형을 간직한 여성 캐릭터를 커스틴 던스트는 꽤나 설득력있게 보여준다.
모든 사랑 이야기에는 동화적 속성이 있다. 사랑의 영원함에 대한 맹신과 그것의 신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업 사이드 다운>은 판타지 영화와 같은 설정에 사랑의 순수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신앙처럼 따르고 있다. 단순화된 설정과 초현실적 화풍으로 채색된 스크린의 질감은 이 이야기를 현대의 동화로 완성해낸다. 제목이 영화의 주제이자 특징, 소재로 채워지는 영화가 바로 <업사이드 다운>이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