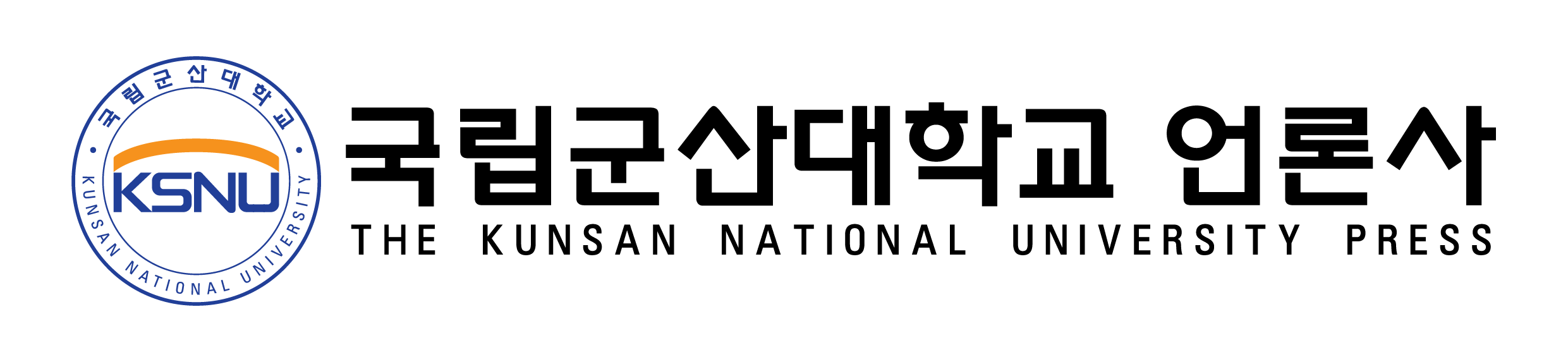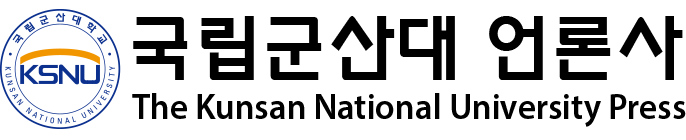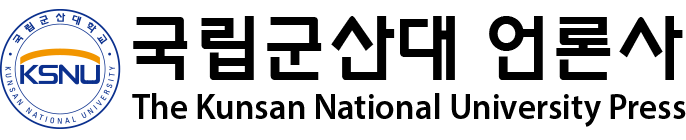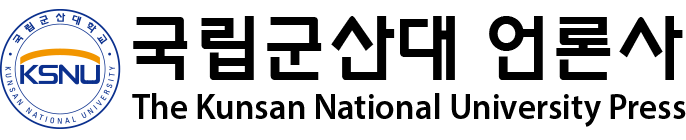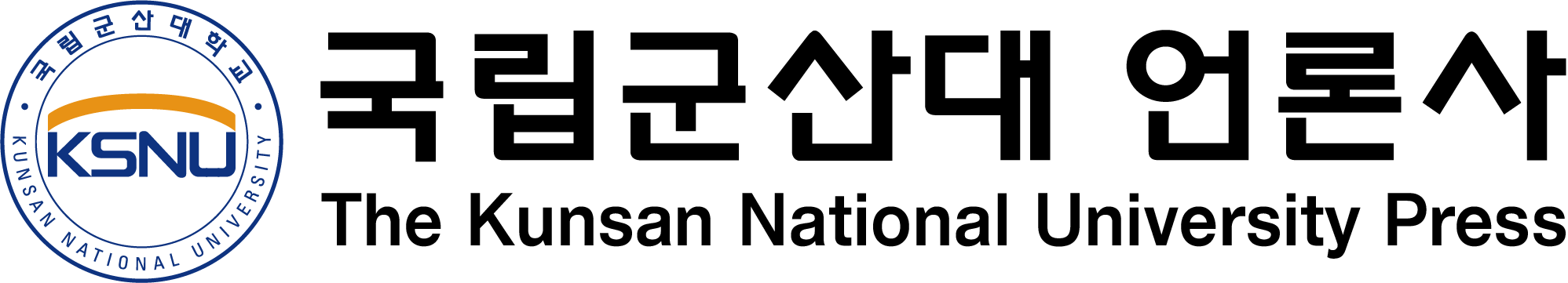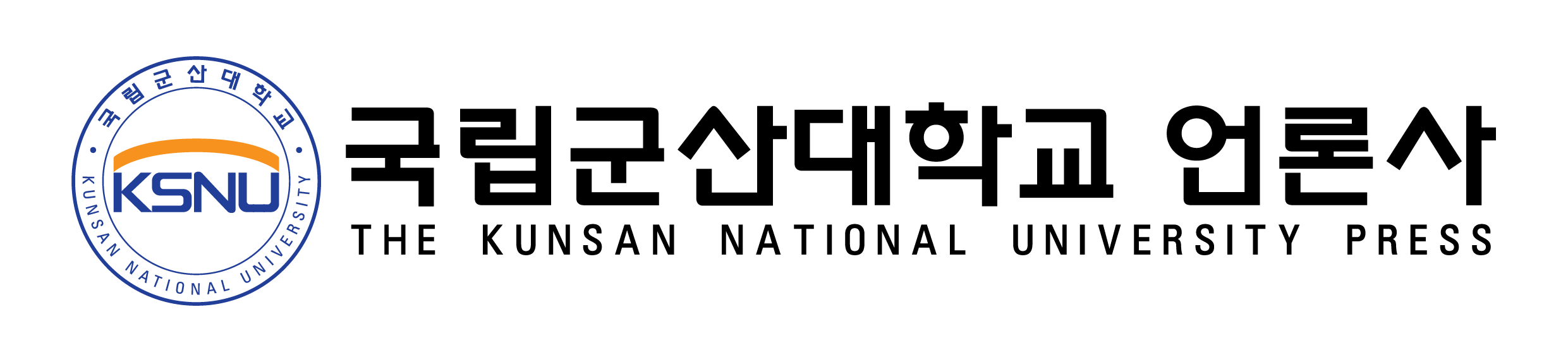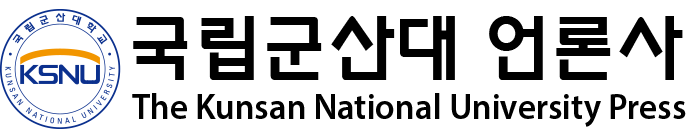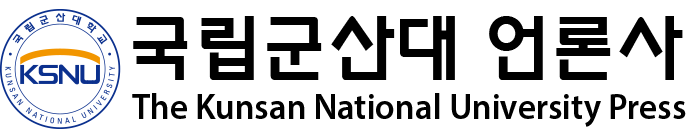한 수습기자의 버킷리스트
언론사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
 |
| ▲ 박주영 수습기자 |
대학에 올라와 스스로 다짐한 게 있다. 바로 ‘하고 싶은 것 하기’이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일인데 ‘이제까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난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다. 내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써 내려간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기회는 적었고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간직한 채 살아왔다. 그렇게 글에 욕심이 있던 나는 새로운 글에 도전하고 싶었다. 마침 대학 입학 후, 언론사에서 기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새로운 글인 ‘기사’를 쓸 좋은 기회다 싶어 바로 지원했다. 그 후, 첫 회의 때의 두근거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평소 보지 않던 뉴스를 보며 안건을 찾고, 내 이름이 박힌 신문을 보고 싶어 안건을 스스럼없이 제안했다. 직접 인터뷰를 하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는 새로운 경험에 많이 우왕좌왕하기도 했었지만, 이런 고생 끝에 내 이름이 적힌 신문과 기사를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니 더 열의가 타올랐다. 시간이 지나, 익숙하게 기사를 쓰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뿌듯함을 느낀다.
언론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기사 작성뿐이 아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기사를 보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일하는 것에서도 많이 배우는 중이다. 좋은 안건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게 되는 회의가 아직도 두렵기도 하지만, 함께 일하는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 기다려지기도 한다. 지금은 이런 경험들이 쌓여 정기자라는 직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수습기자로서 정기자란 타이틀은 무겁게 다가온다.
내 이름 세 글자가 담긴 기사를 하나씩 모으면 행복을 느끼고 더 멋진 기사를 쓰고 싶다는 욕심이 든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언론사에서 일하며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고, ‘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깨우칠 수 있었다. 또한, 이 수습月기를 통해 언론사를 깊게 생각해보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과 언론사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박주영 수습기자의 수습月기는 끝이 났다. 이제는 기자로서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소식들이 기대되는 오늘이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