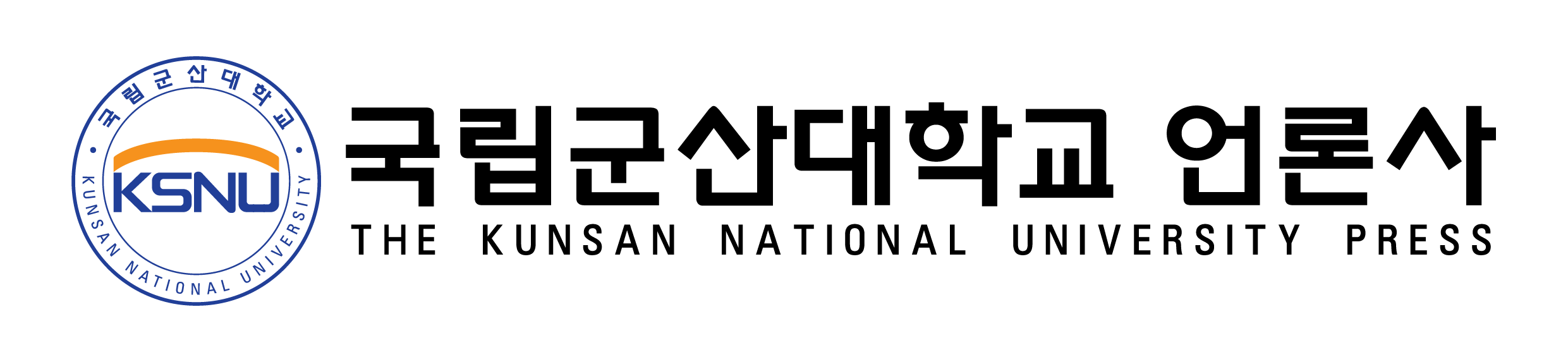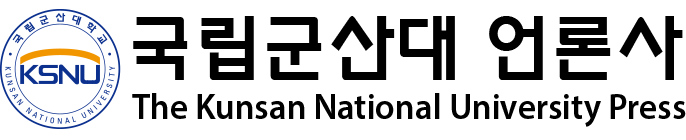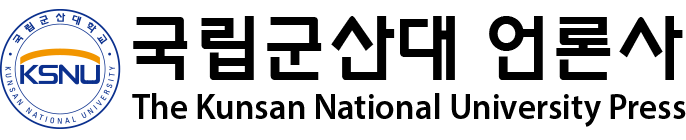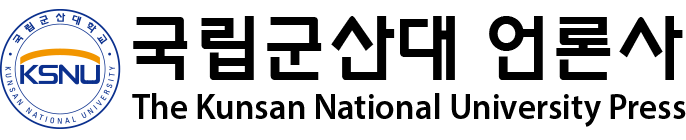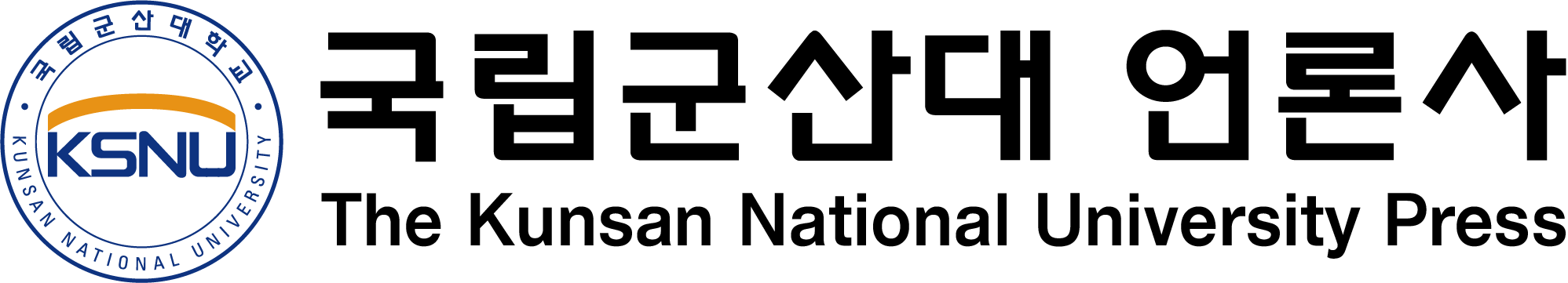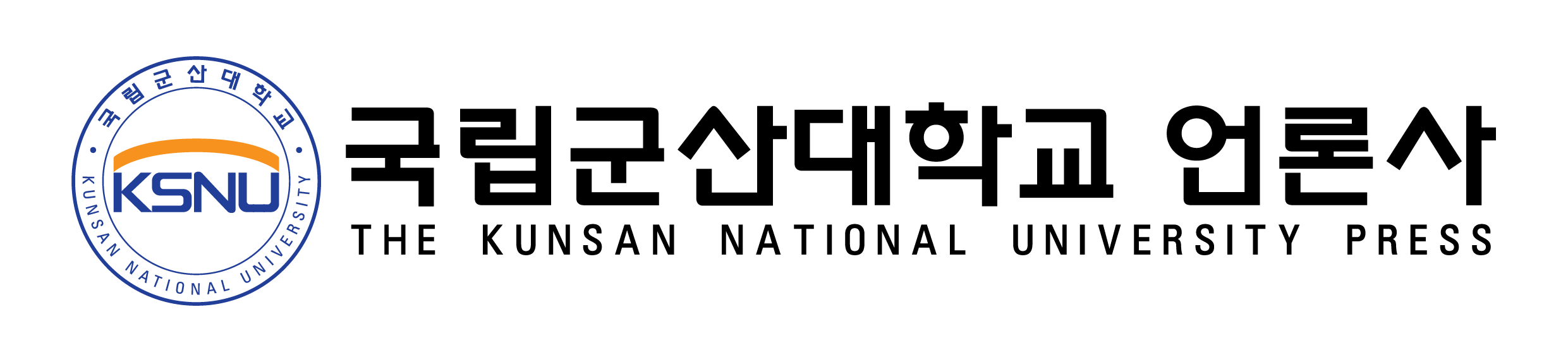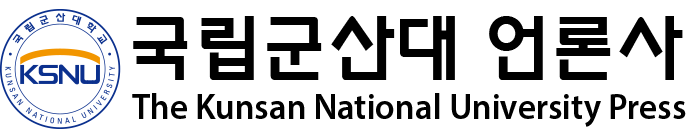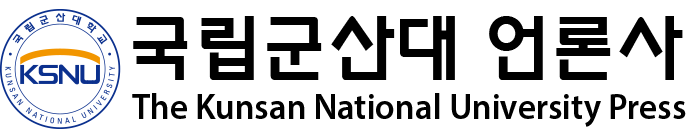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하여 좋은 소설이 요구하는 덕목 중 하나는 ‘전혀 새로운 소재’보다는 ‘낯익은 소재를 낯설게 풀어내기’이다. 오늘 소개할 김이설의 장편 소설 ‘환영’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 역시 낯선 소재가 아니라 낯익은 소재를 낯설게 풀어낸 작가의 서술 방식에 있다. 소설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낯익은 소재를 가지고도 낯설게 풀어낼 줄 아는 작가의 입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이다.
 |
||
소설 속 여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 그녀의 가족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우선 수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만’하고 있는 무능력한 남편과 두 돌이 지나도록 걷지 못하고 엉덩이 걸음으로 몸을 움직이는 장애인 딸이 있다. 그들 말고도 유독 그녀에게만 책임감과 희생을 강요하는 친정엄마와 크고 작은 사기를 치거나 당하며 전국을 떠도는 남동생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동생이다. 그녀의 여동생은 전세방을 뺀 돈에 그녀가 마지막 목숨 줄이라 여기며 준비해온 가게를 차릴 돈까지 챙겨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잠수를 타 버렸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나중엔 노름빚에 쫓겨 툭하면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한다. 아무리 인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가혹한 것이라고는 해도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은 조합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 한 것이, 그녀에게 기생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소설 속 여자의 삶이 척박한 만큼 그녀의 척박한 삶에 기생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 역시 그녀 못지않게 힘에 부친 것이다. 하긴, 세상의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안 그럴까? 혹은 나는? 우리 모두는 사실 저마다의 삶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간혹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았던가 말이다.
소설 속 그녀는 그녀의 삶에 기생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남들처럼 소박한 여유를 누리며 살아보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물가의 백숙집에 취직을 한다. 그녀는 하루 종일 홀과 별채를 넘나들며 정신없이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백숙을 먹으러온 손님들의 여유를 부러워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나 명예가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백숙집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백숙 한 그릇씩을 먹을 만큼의 여유를 원했을 뿐이다. 그녀는 겨우 그 정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백숙집을 찾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뚱이를 팔았다. 처음 그녀는 남자들과 관계를 한 뒤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사로잡힌 채 백숙집 뒤편에 흐르는 물가로 가서 손을 박박 씻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려울 뿐, 두 번째 부터는 수월해지게 마련이다. 그녀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들과의 관계에 덤덤해졌고 습관처럼 물가로 나가 손을 씻고는 서둘러 다시 백숙집으로 돌아갔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잡히는 지폐는 생각보다 힘이 셌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지폐를 만지작대며 그 모든 모욕감을 묵묵히 견뎌냈다.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는 찾아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그 위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밀려온다. 우리의 삶이란 어쩌면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닐 지도 모른다. 소설 속 그녀가 그런 것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운명과의 싸움에서 끝끝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우리는 늙어갈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는 지금과 달라질까? 글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할지 잘 모르겠다.
지난 일 년 간,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나는 참 즐거웠다. 단 한분의 독자라도 우리나라의 젊은 소설들을 찾아 읽어봐 주셨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기원한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