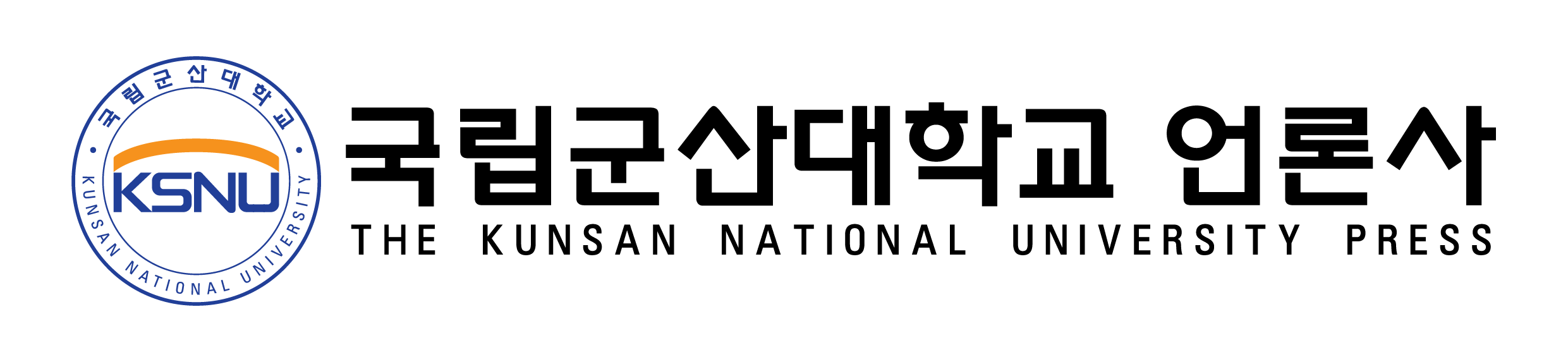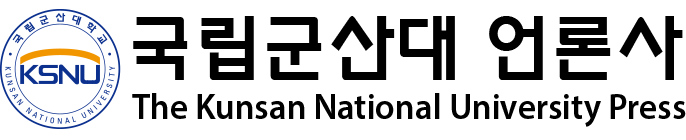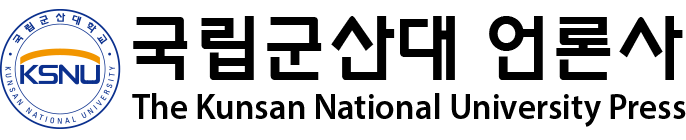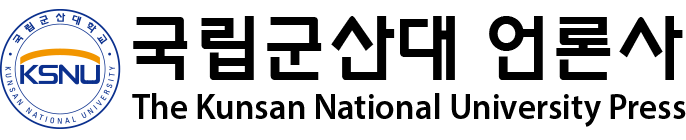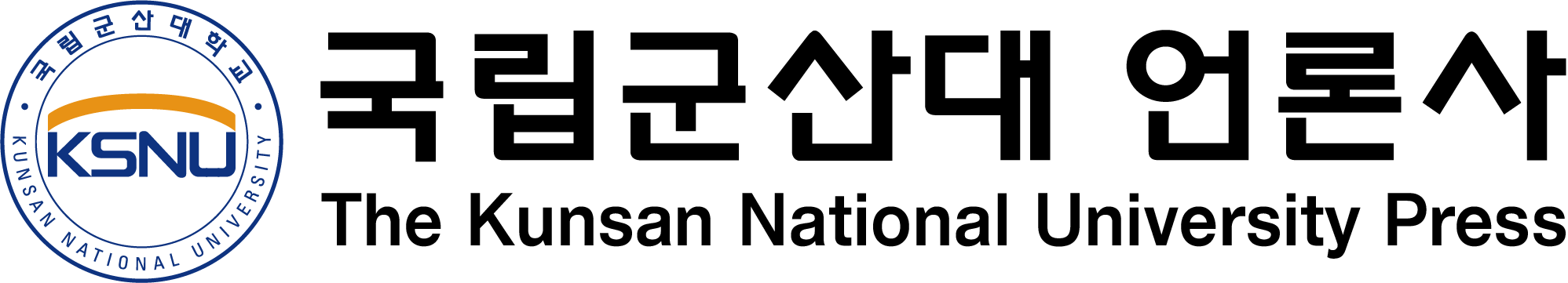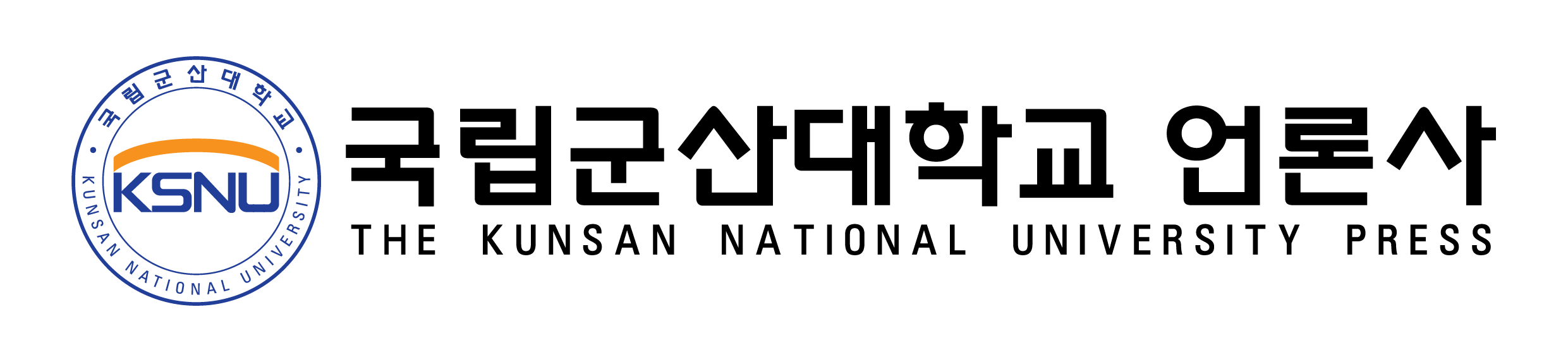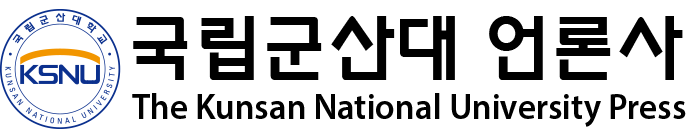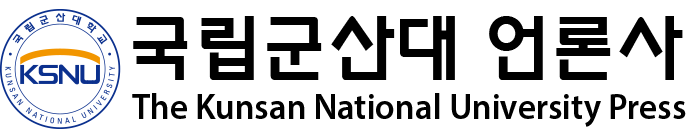칸나의 시절
칸나의 시절
나희덕
난롯가에 둘러앉아 우리는
빨간 엑스란 내복을 뒤집어 이를 잡았었지.
솔기에서 빠져 나가지 못한 이들은 난로 위에 던져졌지.
타닥타닥 튀어오르던 이들, 우리의 생은
그보다도 높이 튀어오르지 못하리란 걸 알고 있었지.
황사가 오면 난로의 불도 꺼지고
볕이 드는 담장 아래 앉아 눈을 비볐지.
슬픔 대신 모래알이 눈 속에서 서걱거렸지.
빨간 내복을 벗어 던지면 그 자리에 칸나가 피어났지.
고아원 뜰에 칸나는 붉고
우리 마음은 붉음도 없이 푸석거렸지.
이 몇 마리 말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칸나보다도 작았던 우리들, 질긴
나일론 양말들은 쉽게 작아지지 않았지.
황사의 나날들을 지나 열일곱 혹은 열여덟,
세상의 구석진 솔기 사이로 숨기 위해 흩어졌지.
솔기는 깊어 우리 만날 수도 없었지.
마주친다 해도 길을 잃었을 때뿐이었지.
이 한 마리마저 키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일론 양말들,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저녁을 밝혀 줄 희미한 불빛에게
나는 묻지, 네 가슴에도 칸나는 피어 있는가, 라고.
‘칸나’는 도로나 공원, 철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병충해에 강해 집단으로 재배하기 좋은 식물입니다. 대체로 꽃이 붉고 개화기간이 길며 관리가 까다롭지 않다네요. 그런데 꽃이름조차 아름다운 이 칸나에서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아원 체험과 빨간 내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어린 시절 고아원 체험을 했는지가 이 작품의 이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이력에 따르면 부모님이 고아원 운영에 관여했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가난의 체험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는 그야말로 먹고사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였던 궁핍의 시절을 거쳐야 했지요. 그 시절을 지나온 어른들은 아직도 빨간 엑스란 내복과 나일론 양말의 추억을 갖고 있어, 이 시에 그려지고 있는 풍경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 시절에 부모와 일가친척을 잃었던 고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이야 고아원의 환경이나 위생이 예전보다는 나아졌겠지만, 난롯가에서 이를 잡는 모습, 빨간 엑스란 내복과 나일론 양말, 볕이 드는 담장에 기대어 가난과 배고픔을 견디는 장면 등은 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라야 했던 고아들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던 고아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같이 울고 웃던 원생들과 작별하고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엑스란 내복을 뒤집어 이를 잡거나, 난롯불이 꺼지면 볕이 드는 담장 아래 앉아 눈을 부비던 일은 점차 희미해지는 기억의 저편으로 물러나 자리잡겠지요. 하지만 당시 아이들의 처지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 같은 감정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이 몇 마리 말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게 있었을까”라는 구절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 짠해지네요.
작품의 말미에서 화자는,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소식이 없는 고아원 동기생들에게 “네 가슴에도 칸나는 피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슴에 피어 있는 칸나는, 옛날 고아원 뜰에 피었던 바로 그 ‘칸나의 시절’을 환유하기도 하겠지만, 그 가난과 슬픔 속에도 서로 나누고 간직했던 정이나 연민, 혹은 끈끈한 유대감이기도 할 것입니다.
강연호(시인, 원광대 교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