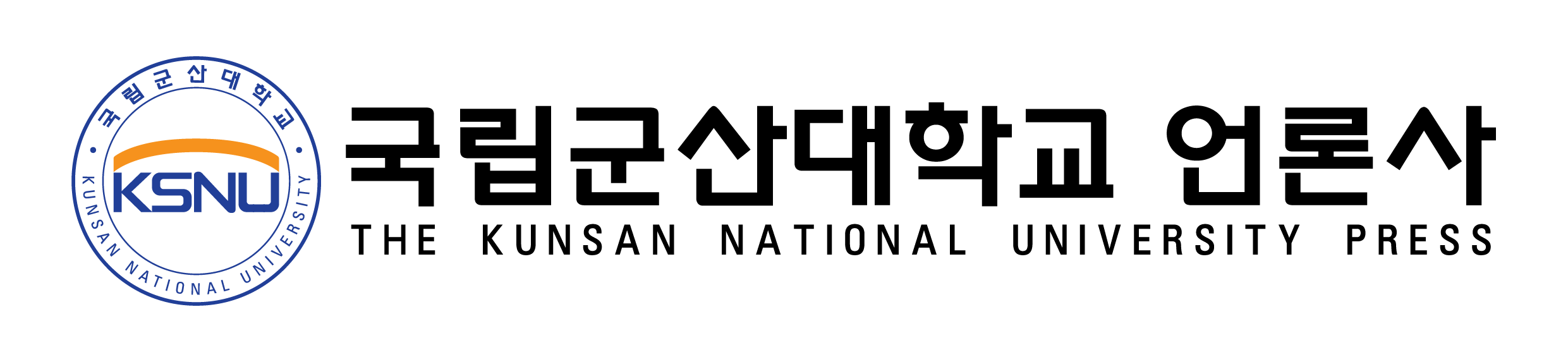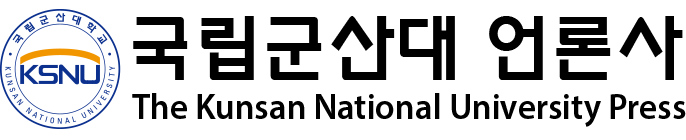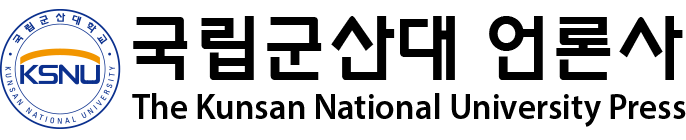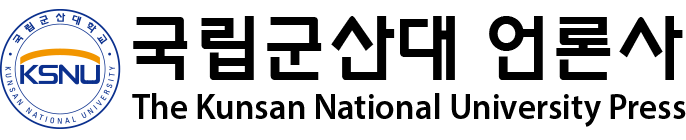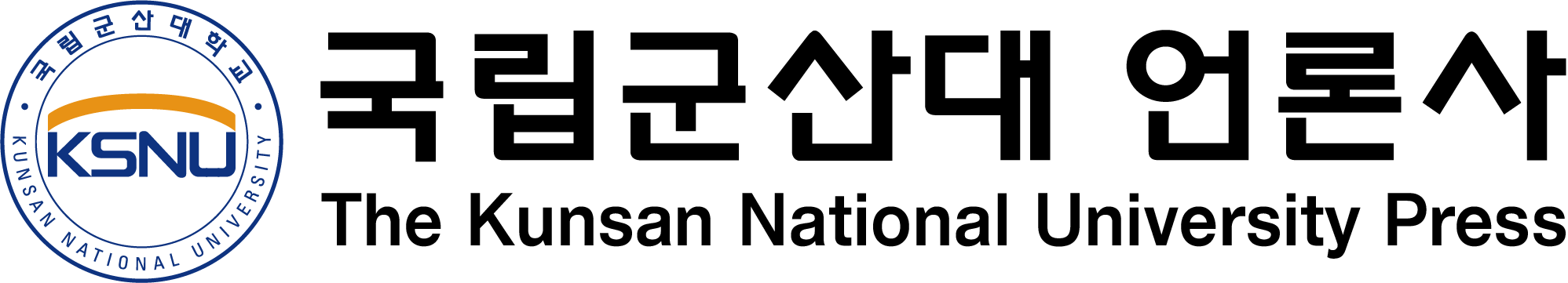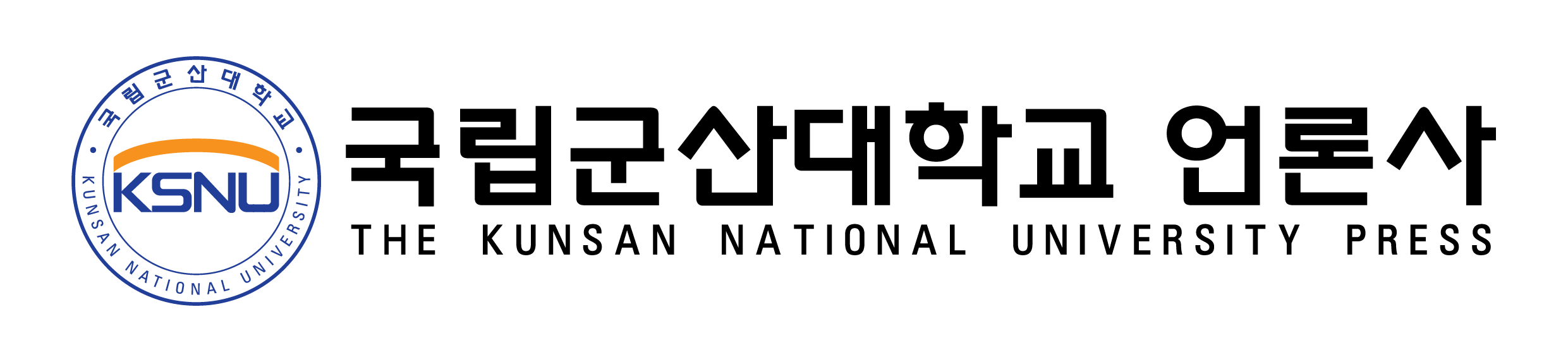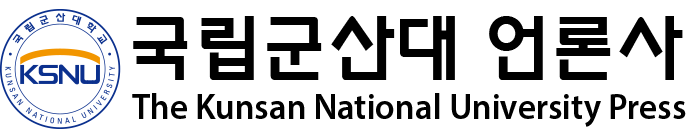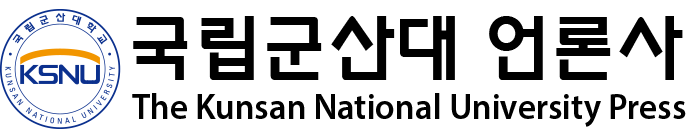문화란 보물을 간직한 섬-고군산군도 2
고군산군도 일부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야미도를 지나 신시도까지 연육되어 차량으로 오갈 수 있는 섬 아닌 섬이 되었다. 여전히 대부분의 섬이 바다에 둘러싸인 진짜 섬으로 남아 있지만 머지않아 수년 내에 다리가 놓여지고 자동차들이 씽씽 달리게 될 것이다.
고군산군도의 중심인 선유도를 비롯하여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는 이륜차까지만 허락된 좁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섬 곳곳을 걷다보면 섬만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10여년 전 군산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진행하면서 고군산군도 구석구석 안다녀본 곳이 없었다. 그때 인터뷰하며 알게된 무녀도 아저씨의 안내로 깊은 숲 속에서 마주한 ‘초분(草墳)’은 고군산도를 전시실 디오라마로 옮겨올 만큼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다.
초분(草墳)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의 해안가와 섬에서 주로 행해지던 장례풍습이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들 지역에서는 많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서해에는 무녀도에 1기만 남아있다.
초분은 말 그대로 풀로 만든 무덤이다. 시신 땅 위에 올려놓고 짚이나 억새, 풀 등을 엮어 이엉을 덮는 형태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풀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이렇게 2~3년 정도 두어 육탈되면 남아있는 뼈를 씻어 땅에 다시 묻는다. 초분에 얹은 이엉은 비바람에 썩게되면 1년에 1~2번 정도 새 것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어쩌면 왜 해안가와 섬에서 초분이란 장례풍습이 생겨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다로 고기잡이를 떠난 사이 기다리던 사람이 죽으면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한다. 때로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매장할 땅을 구하지 못했을 때도 사용되었다. 무녀도에서 만난 마지막 초분이 그랬다. 가난한 아들이 땅이 없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땅에 묻지 못하고 깊은 산 속에 초분을 만들고 해마다 이엉만 갈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초분이라는 이 시를 읽다보면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초분을 만들던 사람들의 삶과 서글픈 이야기가 느껴진다.
처음 엄니 덮을 적엔 / 소락소락 하늘로 치뻗치던 짚풀들이 / 바닷바람에 하느작 물러 어느새 / 쥐 숨듯 숨이 죽었소 / 죽을 둥 살 둥 / 그물끈 쥐어 잡고 / 구명삭에 올라서도 / 엄니 생각하면 / 고단에 달달 떨리던 다리도 / 동실, 힘이 들어가더랬는데 / 잔바람에 뒤곁소리 조금만 술렁거려도 / 파도 거 암시랑도 아니게 해주소 해주소 / 실성한 사람처럼 치성 올리던 / 엄니 손에 닳고 단 / 그 모지랑이 소래기로 술 퍼마시다 / 디글디글 엄니 생각에 속맘 에굽어가다 아파서 / 짚풀에 용마름 가지런히 덮고 / 노을 구경 늘씬 잘하고 계신 / 엄니 못살게 치대러 왔는데 / 어이, 부전나비 한 마리 /뭔 일로 오늘 엄니도 나와부렀네(作 소화)
지금은 무녀도의 초분이 향토자료가 되어 안내판도 설치되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잡아두지만 시간을 따라 진짜 초분은 먼 이야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요즘 어느 방송에서는 새만금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기 위한 백일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녀도 초분처럼 사라져가는 전설과 풍습을 지켜내는 일 또한 우리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기 위해 해야할 일일 것이다.
지금 박물관에 가면 1960년대 이후 군산을 바라볼 수 있는 사진전 “군산의 기억”이 진행되고 있다. 불과 40여년 전 선유도 사진 앞에서 사람들은 흥미롭게 웅성거린다. 선유도 모래사장이 바다였었느냐며...이렇듯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희미해지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옛 문화를 지켜내는 일이란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일이기도 하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