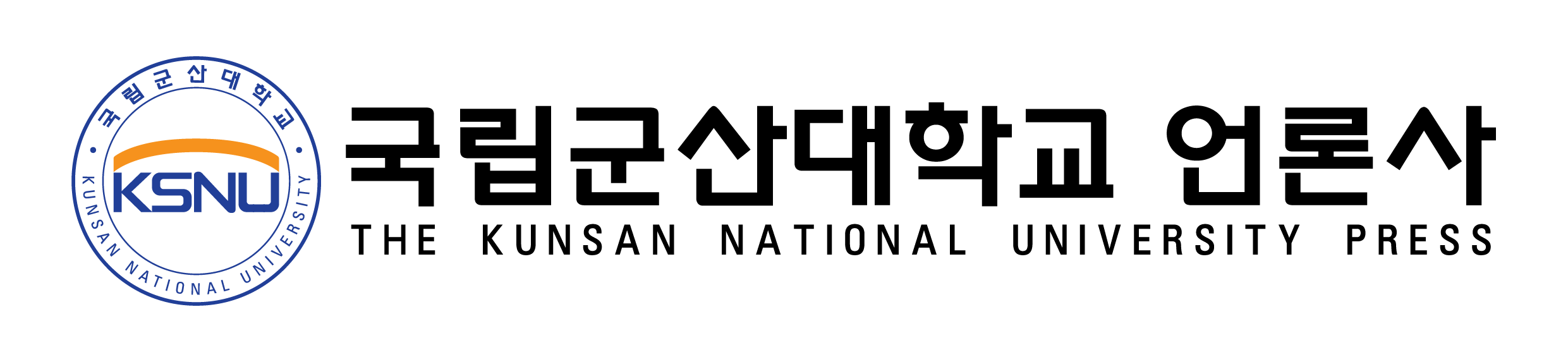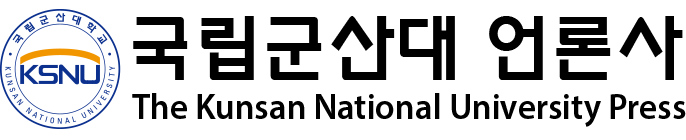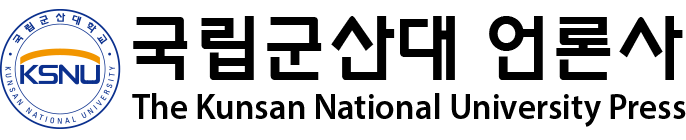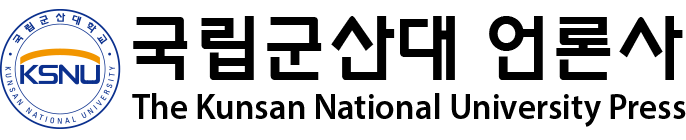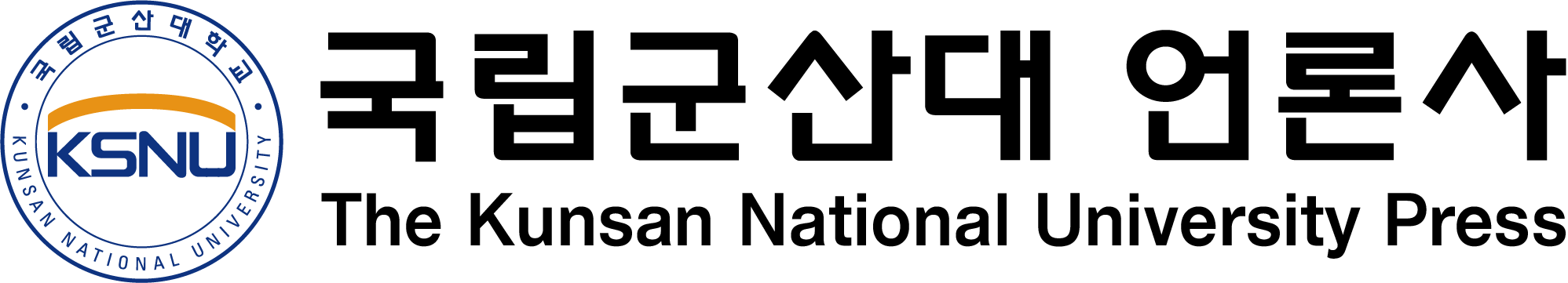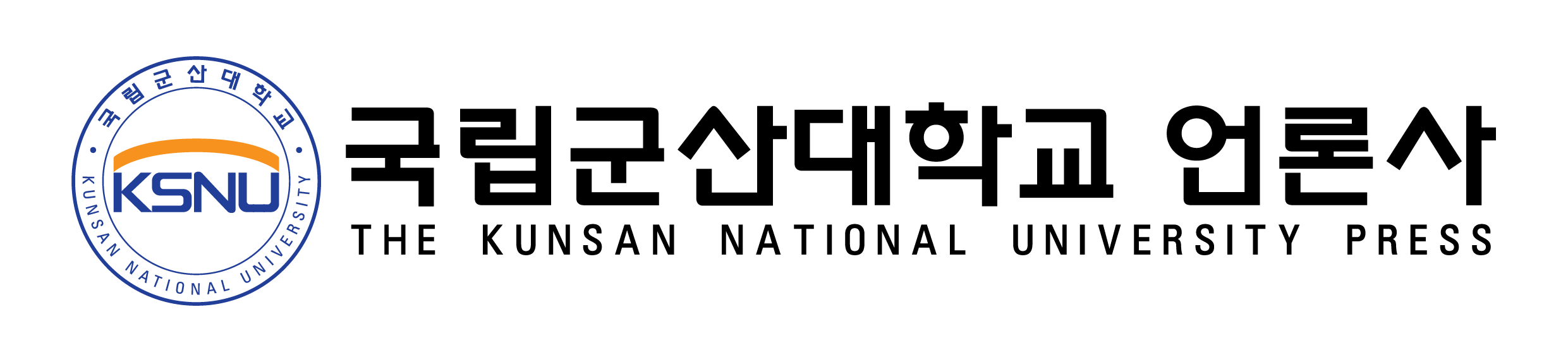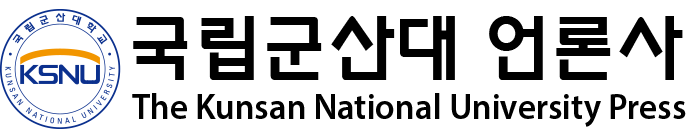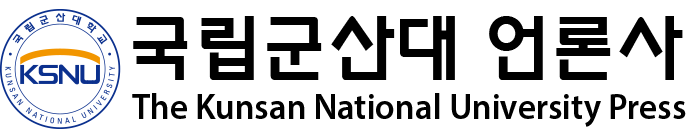나의 또 다른 이름
 |
| ▲ 노유진 기자 |
언론사에 처음 발을 들였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였던 나는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의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없었다. 이에 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대학 생활 적응이 힘들었었다. 하지만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수업을 듣는 것뿐만이 아닌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언론사’였다. 하지만 넘치는 의욕과는 달리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망설이다가 쌀쌀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어서야 지원서를 보내게 되었다. 지원서를 내는 순간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지원을 망설였던 순간들은 오늘날 후회로 다가왔다. ‘조금 더 일찍 지원했다면 더 나은 글을 쓰고, 더 좋은 소식을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요즘은 이런 후회를 의욕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하나하나 덧붙여가며 완성해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려 한다.
교육을 받은 후 첫 기사를 작성했을 때의 기분도 잊을 수 없다. 새로운 안건을 받고 기사를 쓸 때마다, 내가 쓴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볼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은근한 기대감이 함께 몰려왔다. 가끔은 기사를 띄운 하얀 화면 속 내 이름 옆에 붙은 ‘수습기자’라는 명칭이 낯설어서, 스페이스 바를 길게 눌러 일부러 내 이름과 단어 사이를 떼어놓는 장난을 하기도 했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기사를 접하면서 그 장난의 횟수는 줄어들었고, 이름과 직책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이나 나의 실수와 경험도 점점 쌓여갔다. 최근에는 발행된 신문에 나란히 놓인 두 단어가 마치 나의 또 다른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내 수습월기의 제목이 되었다.
늘 낯설어하고 어수룩했던 지난날과 달리 대학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진 지금,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때가 언제였느냐는 듯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며 나 자신을 다듬어가고 있다.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언론사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우리가 다 함께 만든 신문과 영상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직은 서툴지만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선배 기자분들의 열정을 얕잡아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 많은 실수와 경험을 통해 소중하다 느꼈던 5개월간의 이름과 작별하고, 나는 어느덧 ‘정기자’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내가 작성한 기사를 더 많은 학우가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많은 활동을 함께할 나의 또 다른 이름에는 환한 미소를 남기고 싶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