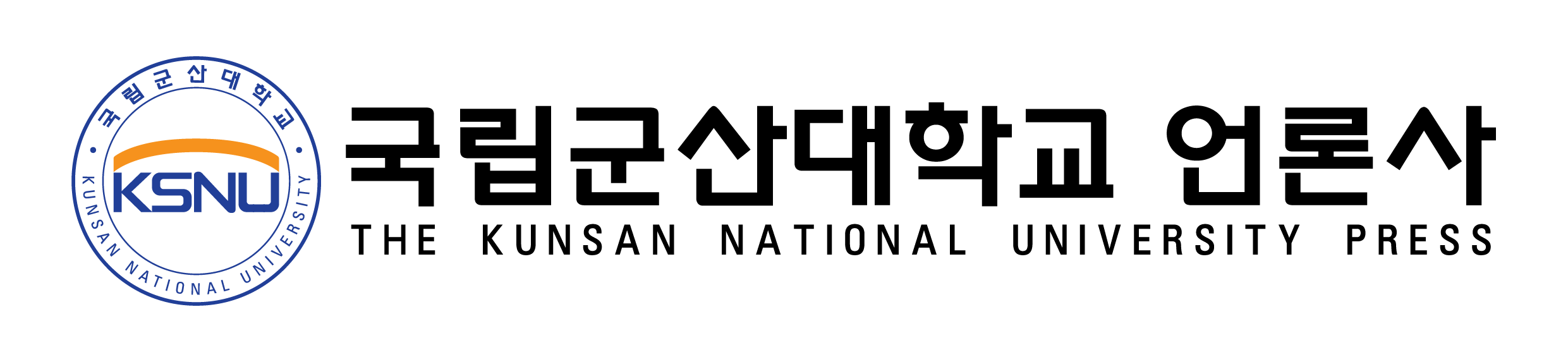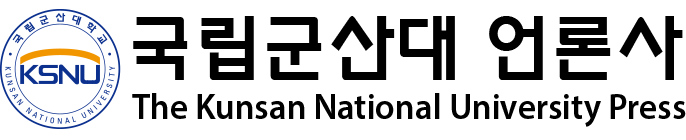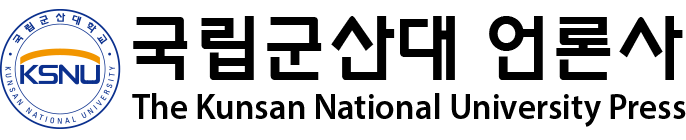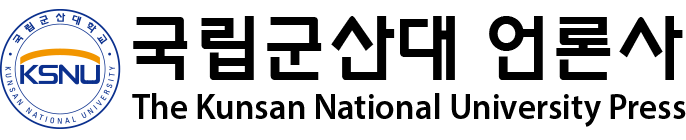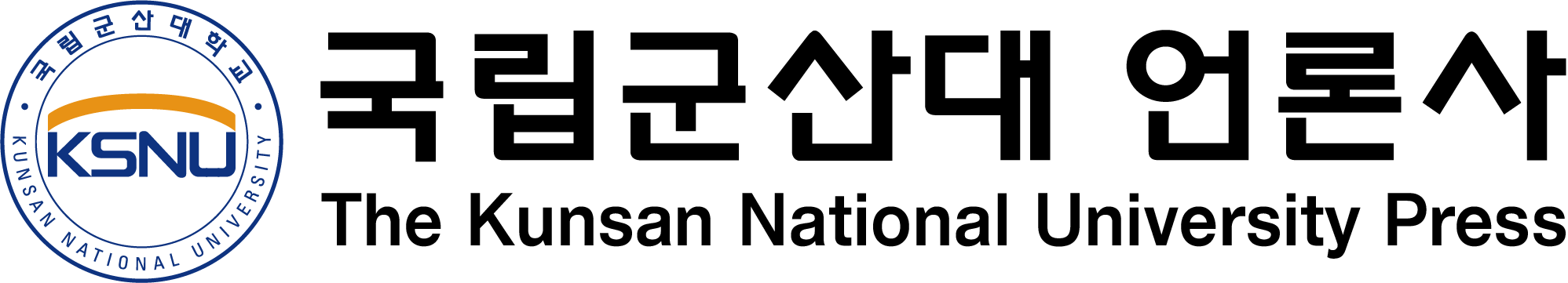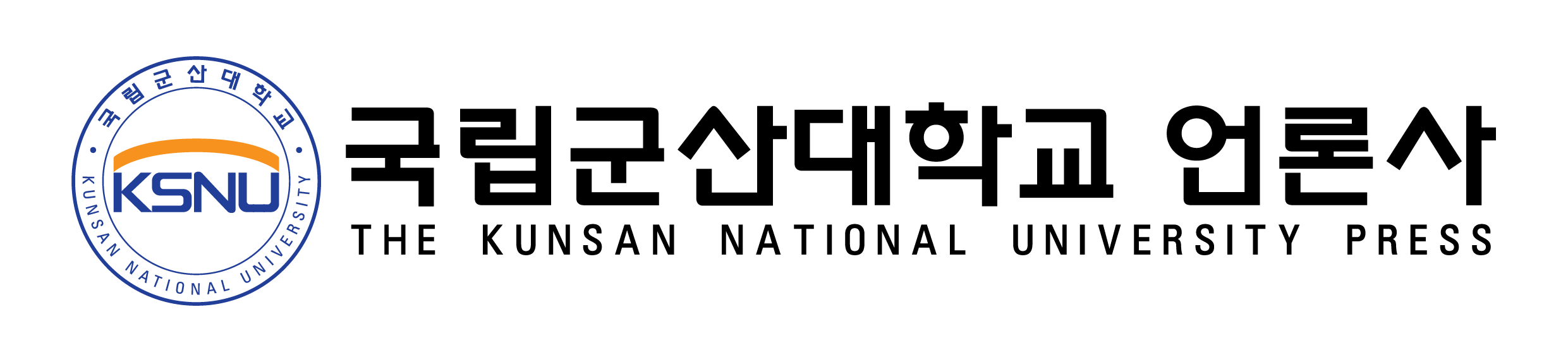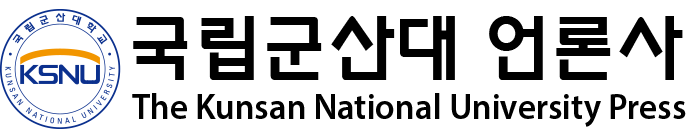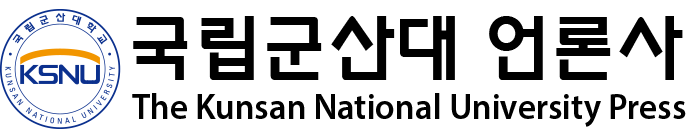오렌지 리퍼블릭 - 노희준
자음과모음
얼마 전 치른 4.11총선 당시 한 유명 소설가가 투표독려를 위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다가 낭패를 본 사건이 있었다. 문제의 정보는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내 투표소의 정오 기준 투표율이 78%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다. 이 정보는 파워트위터리안인 작가의 팔로워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작가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지금에 와서 새삼스레 지난 일을 들추는 것은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작가의 경솔함을 탓하려는 것도, 매체의 특성상 오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작가의 설명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들과 78%라는 비현실적인 투표율마저 의심 없이 믿게 만들었던 그곳,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강남’과 ‘강남 사람들’의 과거 어느 한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아는 유일한 강남 출신 작가(작가 본인은 이런 식의 수식을 끔찍해하지만) 노희준의 장편소설 ‘오렌지 리퍼블릭’을 통해서 말이다.
 |
||
“재래종인 감귤, 개발 전부터 살던 원주민이거나 개발 초기에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로, 운이 좋은 편이기는 했으나 부자라고는 할 수 없었다. 신흥 귀족을 형성한 것은 1980년대 유입된 외래종으로 그들 중 일부가 이후 '오렌지'족으로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온 '탱자'가 있었다. 강남에 살지만 온몸으로 강북인 애들. 자연산 토종이지만 재배종은 아닌 경우.” (20쪽)
작가 자신의 모습이 가장 잘 투영된 듯 보이는 1인칭 화자 노준우(노갈)는 책의 서두에 강남 8학군 아이들을 감귤, 오렌지, 탱자, 세 부류로 나누었다. 자신의 분류대로라면 재래종 감귤인 노갈은 나이키를 신지 못해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중학시절을 거쳐 명문 X고에 입학한다. 딱히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남달리 영리했던 노갈은 자신의 명석한 두되를 이용해 오렌지들(외교관, 국회의원, 재벌가의 자식들)의 모임에 합류함으로써 길었던 왕따 시절에 종지부를 찍는 듯 보인다. 그 증거로 감귤 노갈과 오렌지들은 한데 어울려 가히 주이상스라 일컬어질 만한 일탈을 거듭하며 방만한 청소년기를 보낸다. 사실 이 소설을 읽을 당시엔 원 나이트 스탠드나 스와핑 같은 소설 속 오렌지들의 일탈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즈음에 와서 돌이켜 보건데, 어쩌면 바로 그런 까닭에서 이 소설이야말로 문제적 과거의 어느 한 시절을 무엇보다 치열하게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78%의 투표율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게 만들었던 지금의 ‘강남’과 감귤 노갈과 오렌지들이 좌충우돌하는 책 속의 ‘강남’이 크게 다르게 여겨지지 않으니 말이다.
“나는 다시 왕따가 돼 있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313쪽)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다. 총선 내내 들끓었던 우리들의 마음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해 본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