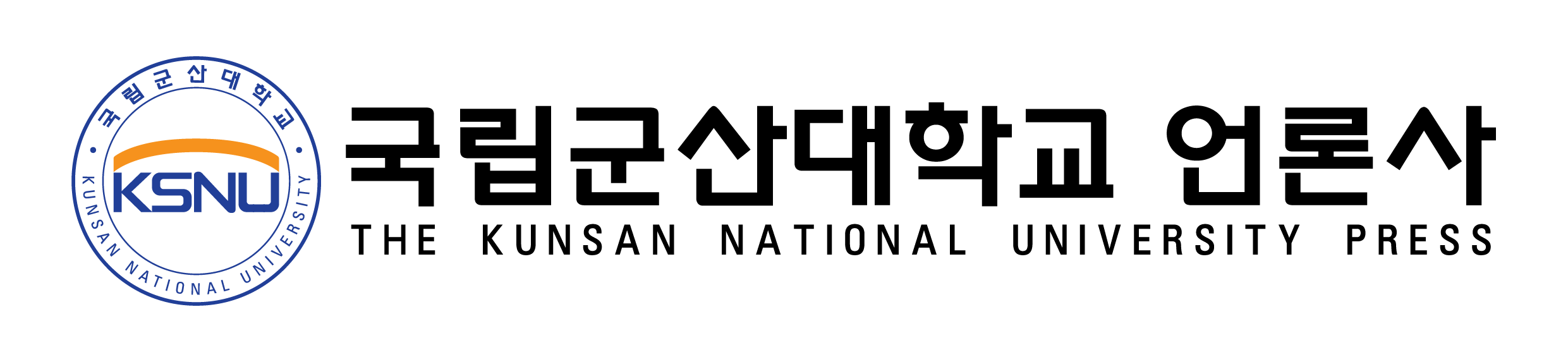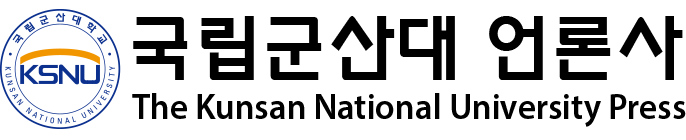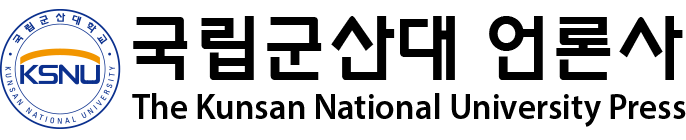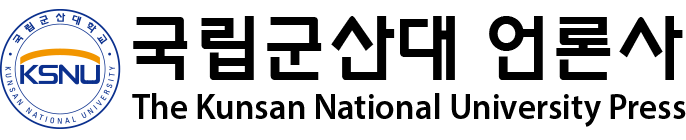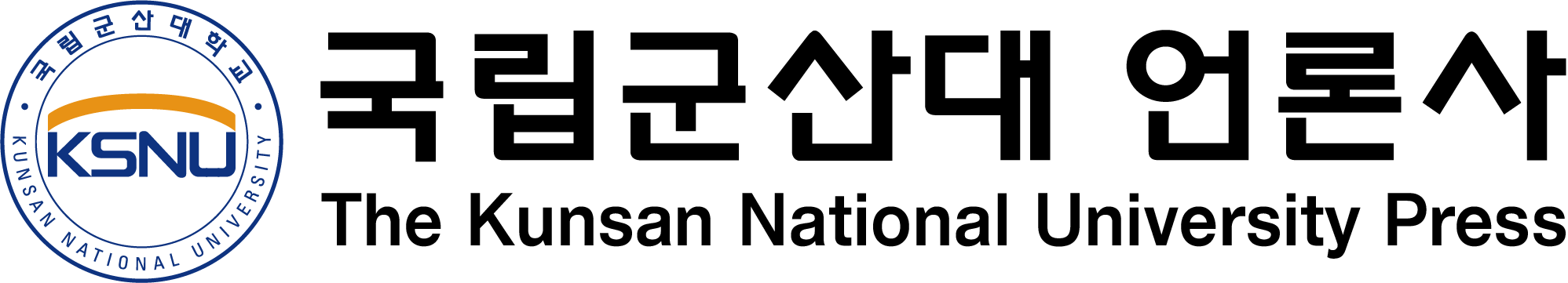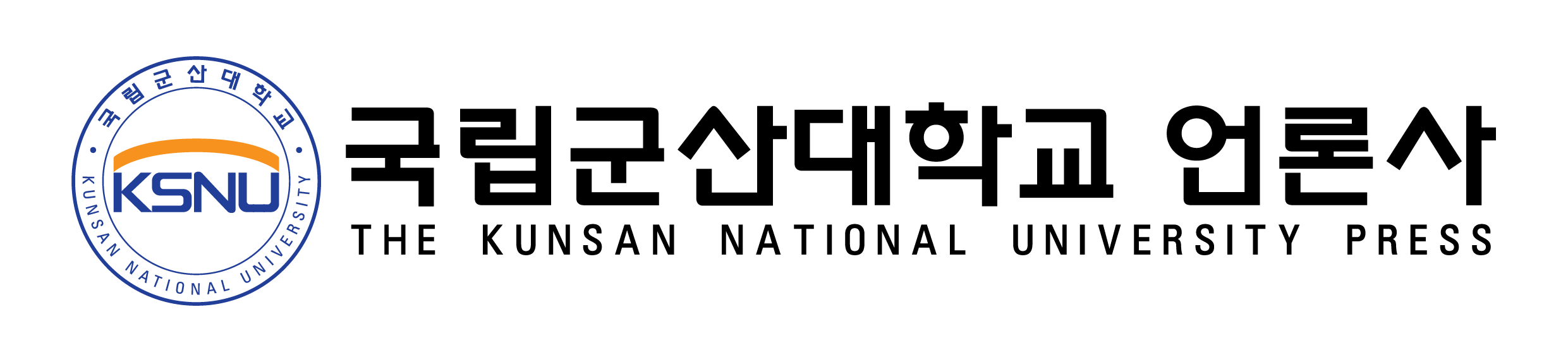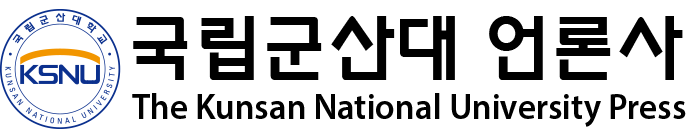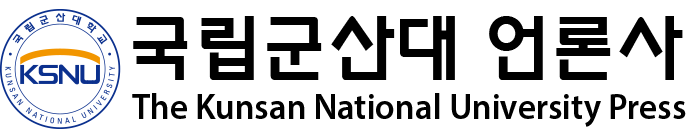유리(羑里)에 가면
유리(羑里)에 가면
노태맹
그대 유리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지.
먼지처럼 가볍게 만나
부서지는 햇살처럼 살자던 그대의 소식 다시 오지 않고
유리에 가면 그대 만날 수 있을까,
봄이 오는 창가에 앉아 오늘은
대나무 쪼개어 그대 만나는 점도 쳐보았지.
유리 기억 닿는 곳마다 찔러오던 그 시퍼런 댓바람,
피는 피하자고 그대는 유리로 떠나고
들풀에 허리 묶고 우리 그때 바람에 흔들리며 울었었지.
배고픈 우리 아이들
바닷가로 몰려가 모래성 쌓고
빛나는 태양 끌어 묻어 다독다독 배불렸었고.
그대, 지금도 유리에 가면 그대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아프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
물 마른 강가에 앉아 있다던 그대와
맑은 물이 되어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그대는 유리를 떠나고
유리엔 우리가 살아서
오늘은 그대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시퍼런 강이 되기도 하겠지만.
시는 때로 불가의 선문답과 같아서 알 듯 모를 듯 애매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언(言)과 절사(寺)가 결합되어, 시(詩)라고 쓰는 건가요? 어쩌면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 삶이 그렇게 알 듯 모를 듯 어렵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유리”라는 곳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유리”는 원래 중국의 고대 역사에 나오는 한 지명인데, 문학작품 속에서는 흔히 죽음의 공간이자 탄생의 공간이고, 유배지이자 낙원이기도 하며, 속박이자 자유이기도 하고, 안쪽이면서 바깥쪽이기도 한, 미묘한 상징의 공간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제목부터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이런 것 다 접어두고 이 작품을 그저 가슴 아픈 연애시로 읽으셔도 됩니다. “먼지처럼 가볍게 만나 / 부서지는 햇살처럼 살자던 그대의 소식 다시 오지 않고” 같은 대목이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적시니까요.
사랑이 끝난 뒤 우리는 더러 떠나간 사람과의 재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쪼개어 그대 만나는 점도 쳐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다 헤어진 관계에서 과연 누가 떠나고 누가 남은 것일까요. “어쩌면 그대는 유리를 떠나고 / 유리엔 우리가 살아서 / 오늘은 그대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 시퍼런 강이 되기도” 한다는 것처럼,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았는지는 사실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요. 헤어진 당사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떠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남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사랑은 한없이 달콤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한없이 구속하는 것이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끝난 뒤에는 늘 후회 섞인 한탄이 남는가 봅니다. “우리는 이제 아프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 물마른 강가에 앉아 있다던 그대와/ 맑은 물이 되어 만날 수도 있을 텐데”라고 말입니다. 돌아보면 사랑의 열병을 앓던 한 시절, 지나치게 사랑에 몰입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때로 사랑을 강요하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서로를 구속하려 하고 서로에게 잔인해지기도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양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어째서 달콤하면서도 쓰디쓴지, 자유이면서도 속박인지 그 감정의 파문은 알 듯 모를 듯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안쪽이면서 동시에 바깥쪽이기도 한 미묘한 상징의 공간인 “유리”처럼 말이지요.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