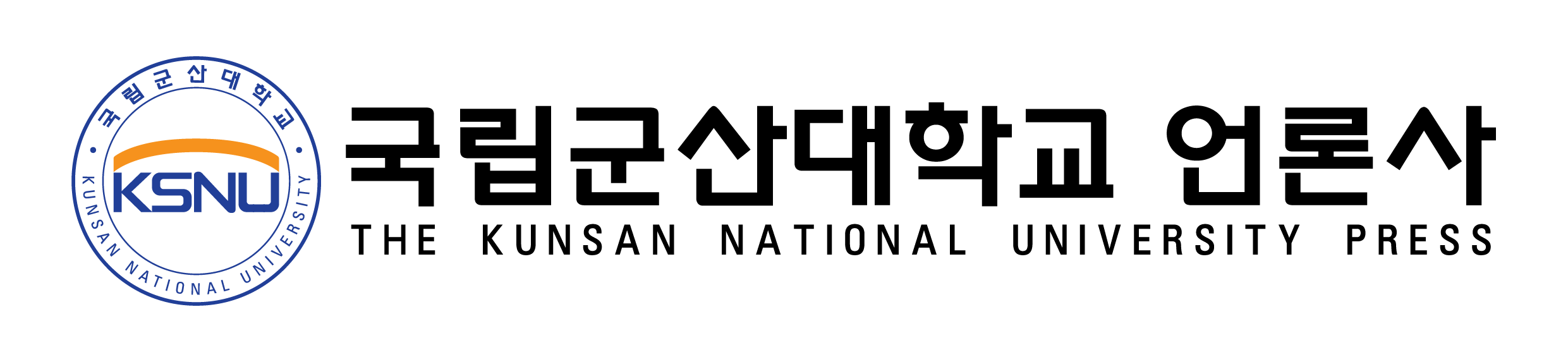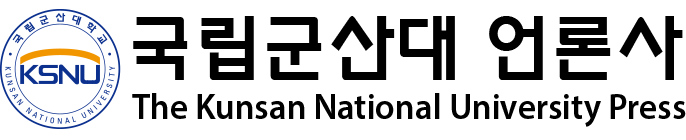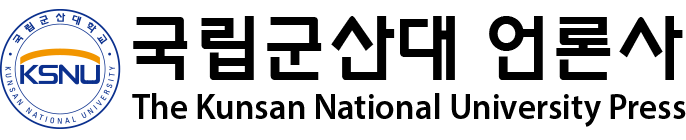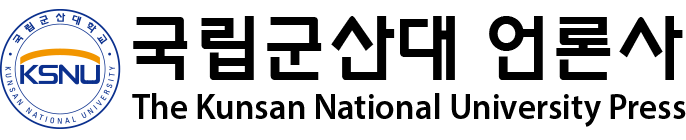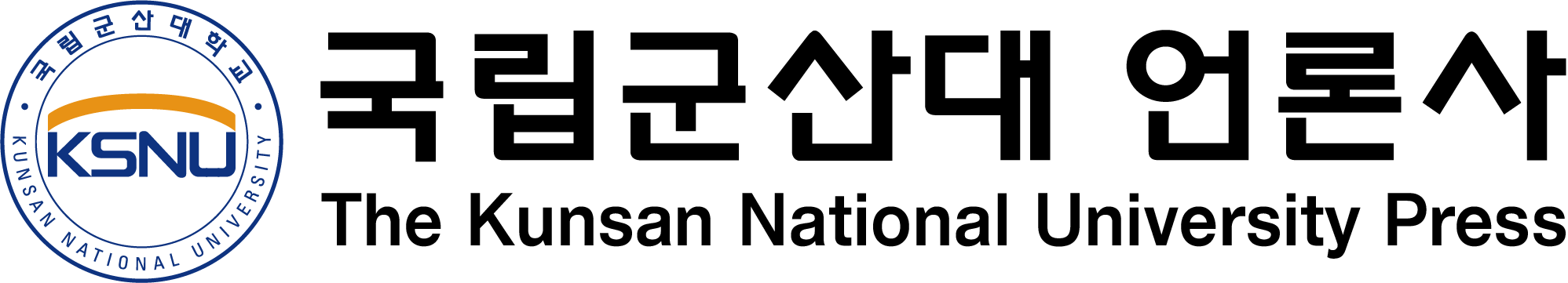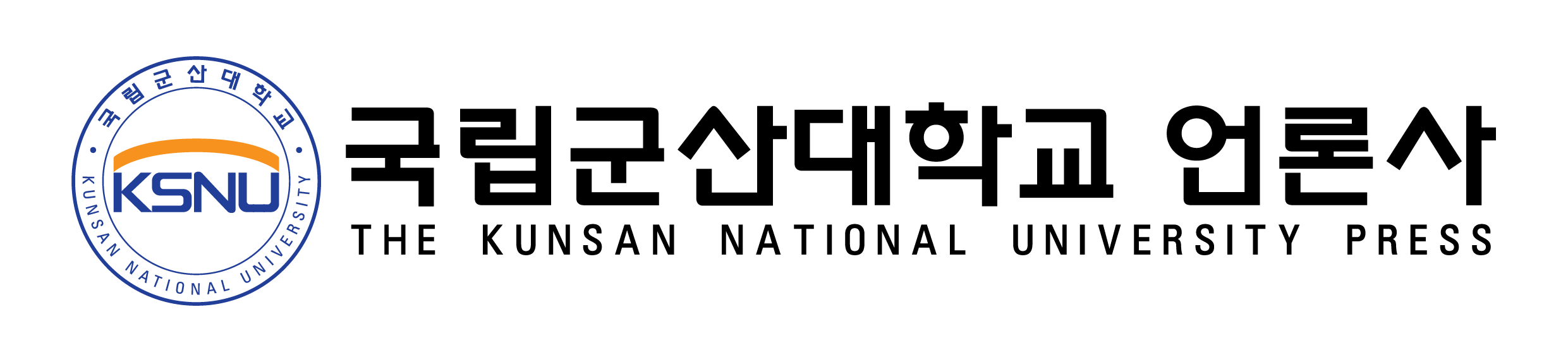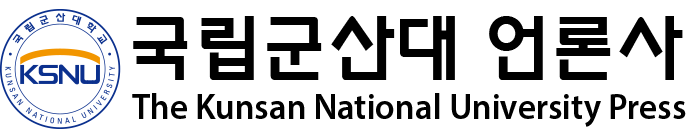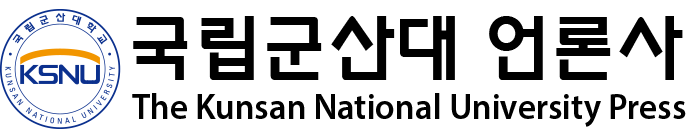가족용 스포츠 드라마의 소박한 감동 <코리아>
<코리아>는 20년 전 실화에서 출발한다. 바로 유례없던 남북 단일 탁구팀 이야기로부터 말이다. 20여 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상대적 추억의 대상이다. 지금 30대 중반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비교적 생생한 기억의 대상이 되지만 20대에게는 전설이 된다. 20여년 전이란 역사가 되기엔 아직 짧고 추억이라고 하기엔 매우 가까운 그런 과거이기 때문이다.
<코리아> 역시 “현정화”와 탁구를 바로 연상해 낼 수 있는 세대들의 동질감에서 시작된다. 이런 동질감 위에 남북 분단의 역사, 기록적 사건을 덧대 하나의 픽션이 완성된다. 영화보다, 허구보다 더 감동적인 스포츠라는 드라마 위에 영화적 상상력과 장르의 관습이 또 다른 허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
<코리아>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갖는 접점은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라는 사실이다. 감동은 일단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상황에 처해있는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다. 아무런 공지도 없이 뉴스에서 단일팀 소식을 듣게 된 탁구 국가 대표들은 일본에서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해 늘 “적수”로만 만났던 북한팀과 합류하게 된다.
두 팀은 서로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남한 팀의 멤버 중 한 명인 “일성”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싸움의 빌미가 되니 말이다. “젓가락으로 모가지를 딴다”라는 식의 험한 말이 오가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꽃미남 탁구선수에게 반한 남한 여성 탁구선수도 등장한다. 갈등과 긴장이라는 관습적 과정을 거쳐 드디어 두 팀은 “탁구”라는 공동 언어로 융합된다. 마침내, 갈등을 넘어서 탁구 동료, 스포츠맨쉽으로 두 팀은 진짜 하나의 팀이 된다.
어떤 점에서 <코리아>는 우리가 스포츠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관습적 클리쉐 전부를 동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좀 더 고급하고 세련된 스포츠 영화를 기대하는 관객에게 이 영화는 진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령, <밀리언 달러 베이비>처럼 스포츠 속에 녹아있는 인생의 어떤 깊은 뜻, 아이러니를 보기에는 영화의 깊이감은 좀 낮다.
하지만 이 진부함 역시도 좀 상대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만일 <코리아>를 생애 처음의 스포츠 영화로 선택한 어린 관객에겐 클리쉐적 장면이 매우 감동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클리쉐를 피해갔다면 아마도 남북한 단일팀이 생겨나고 사라졌던 정치적 이면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를 제작한 정치적 표면 뒤에 있는 복잡한 셈법을 알고 싶어 하는 관객은 많지 않다. 관객들은 스포츠 드라마에서 감동을 원하지 스포츠계의 복잡다단한 계산 논리나 정치적 거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코리아>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탁구” 연기까지 제대로 소화해 낸 배우들의 호연이다. 현정화에게 직접 사사 받아 팬 홀더 그립까지 보여준 하지원은 노력하는 배우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류순복을 연기한 신인배우나 분위기 메이커를 자임하는 박철민의 연기도 훌륭하다.
누구보다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배우는 바로 배두나이다. 배두나는 리분희라는 인물의 사실감을 잊을 정도로 몰입도 높은 연기를 선보인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해주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코리아>와 같은 작품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본다 해도 누구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순수한 감동이 있다는 점이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본다 해도, 친구들끼리 본다 해도 5월 가족의 달에 볼 영화로 무리가 없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