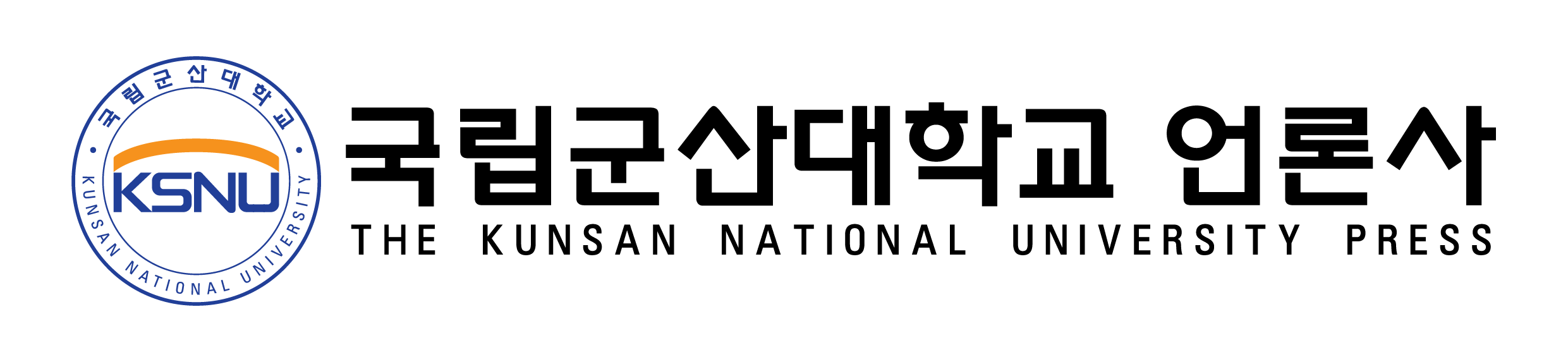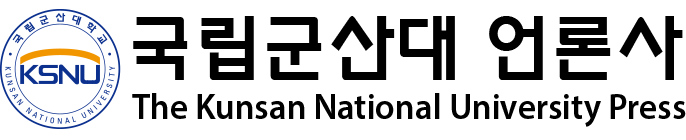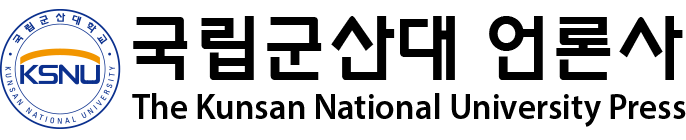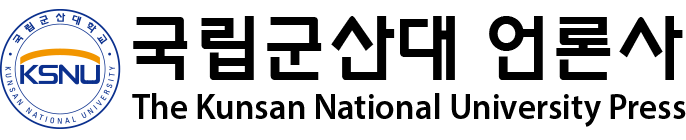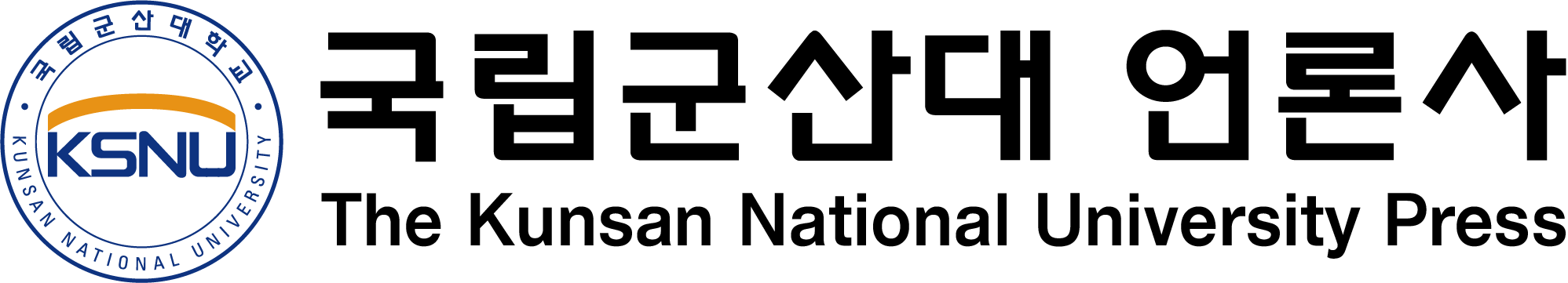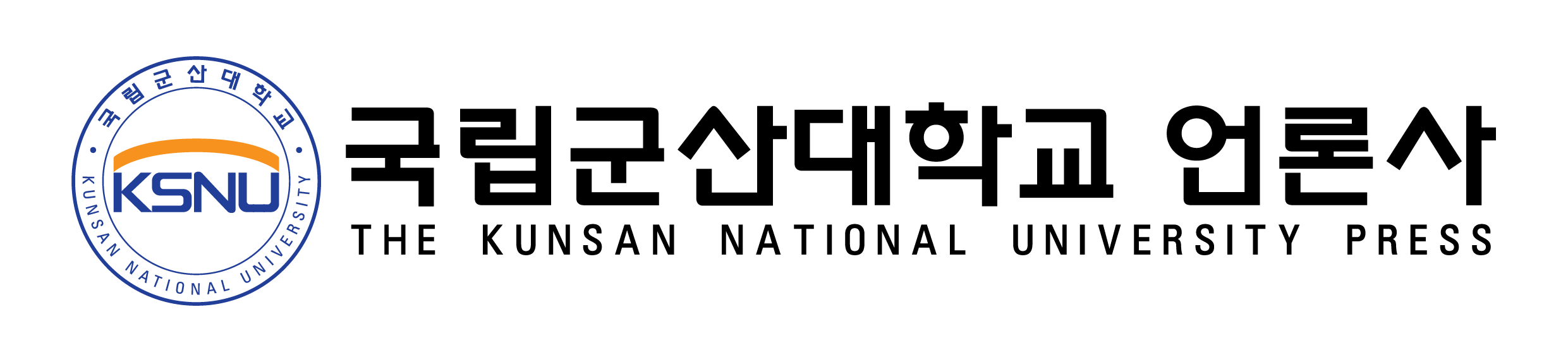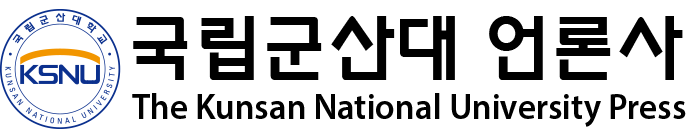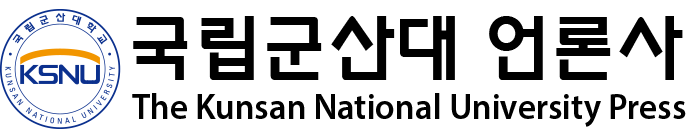고려인 이야기 단상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가장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는 곳이다. 타슈켄트의 공기는 맑거나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싫지는 않았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마르칸트를 들르기 위해서는 타슈켄트에서 꼬박 네 시간을 열차로 달려야 했다. 사마르칸트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땅에 이토록 찬란했던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마르칸트는 눌러 살고 싶을 만큼 좋았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었다.
고려인 작가인 강태수가 쓴 <한 소녀에 대한 생각>(??레닌기치??,1977.1.6~1.7)에서 화자는 사마르칸트에서 타슈켄트로 오는 열차 안에서 12세의 조선인 소녀 류드밀라를 만난다. 밀라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소녀는 사마르칸트에 사는 ‘마마’를 만나보고 아버지와 살고 있는 타슈켄트로 돌아가는 길이다. 밀라가 일곱 살 때 그녀의 부모는 헤어졌고, 마마는 꼴랴와 밀라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다. 제 ‘빠빠’와 마마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몹시 부럽다는 밀라. 화자는 어른들의 인내심 부족과 어리석은 자존심으로 사랑의 열매인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 ‘검은 점’을 남기거나 그들의 행복에 그늘을 던지는 세태에 씁쓸해 하며, 나이보다 성숙한 밀라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열차에서 프랑스인 꼬마들을 만나자 문득 작품 속 밀라가 떠올랐었다. 열차라는 공간이 상기한 연상 작용이었다. 짬을 내 꼬마들에게 산수를 가르쳤다. 문제를 들고 와 풀어달라는 것이었는데, 숙제인 듯했다. 아이들의 부모는 프랑스와 우즈베키스탄을 왕래하며 산다고 했다. 서로의 언어를 잘 몰라도 수학기호는 세계 공통어로 충분했다. 그들 프랑스인들에게는 고려사람도 ‘까레이스키’였고 한국에서 온 나 또한 ‘까레이스키’였다.
사마르칸트를 다녀온 다음 날은 타슈켄트 시내의 바자르에서 고려인 할머니들을 만났다. 바자르에서 만난 고려인 2세대 할머니들의 얼굴은 예상보다 밝았다. 한국의 여느 할머니들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았을까. 고려인 1세대의 경우 현재는 많이들 돌아가셔서 몇 분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했다. 할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알아듣기에 힘들지 않을 정도, 딱 그만큼만 유창했다.
그녀들은 밝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묻어났다. 구소련이 해체되기 이전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달라고 여쭈었을 때, 공통적으로 구소련일 때가 좋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련이었다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장에 나와 일을 할 까닭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연금생활을 했을 것이기에,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있을 거라 했다. 사실이 그랬다. 구소련이었다면 연금생활(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할 연세들을 훌쩍 넘기셨으니까. 그래도 할머니들의 얼굴에 그늘은 없었다.
시장에서 만난 고려인 할머니들에게서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닌, 현 고려인 사회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네들은 거기가 좋다고 했다. 부모의 고향인 연해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실 연해주에 대한 기억도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우즈베키스탄은 할머니들의 고향이었다. 구한말 살기 위해 아라사 땅으로 길떠남을 강행했던 선조들을 비롯하여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아왔던 고려인의 삶도 한 세기를 넘겼다.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한국적 민족주의는 없었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