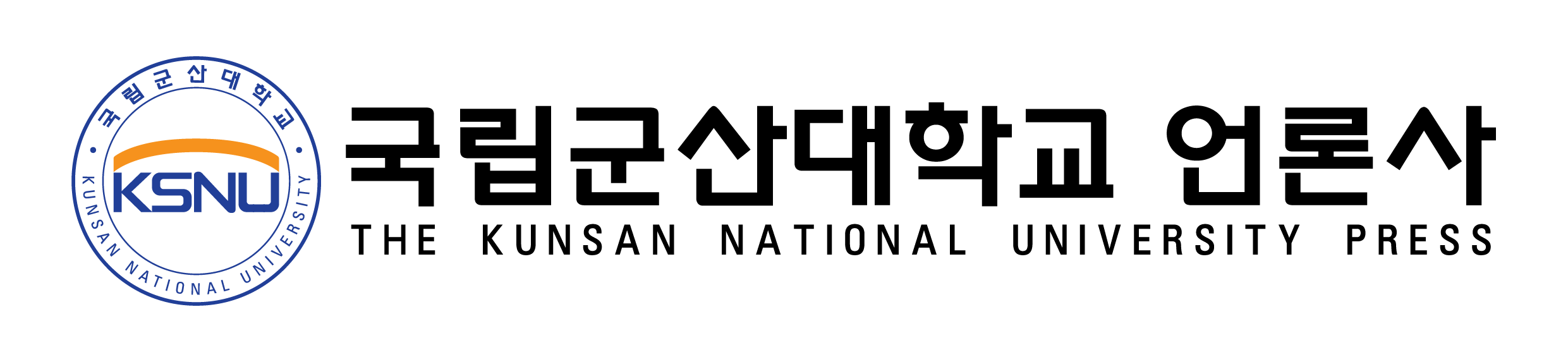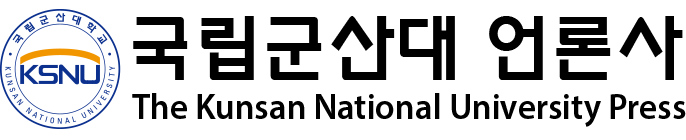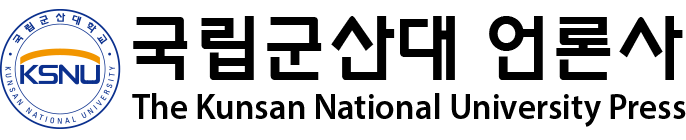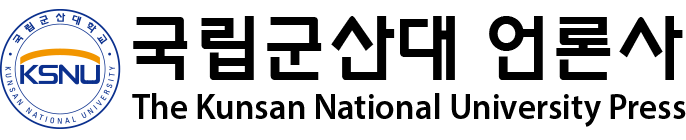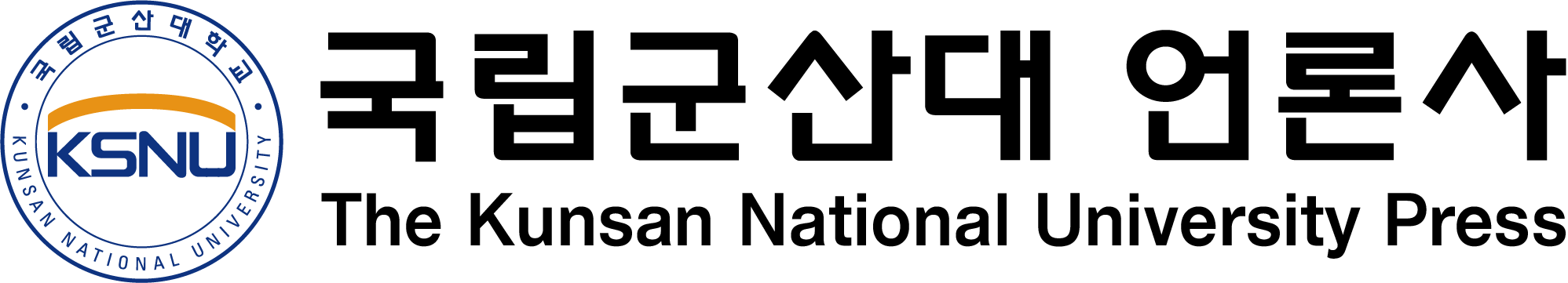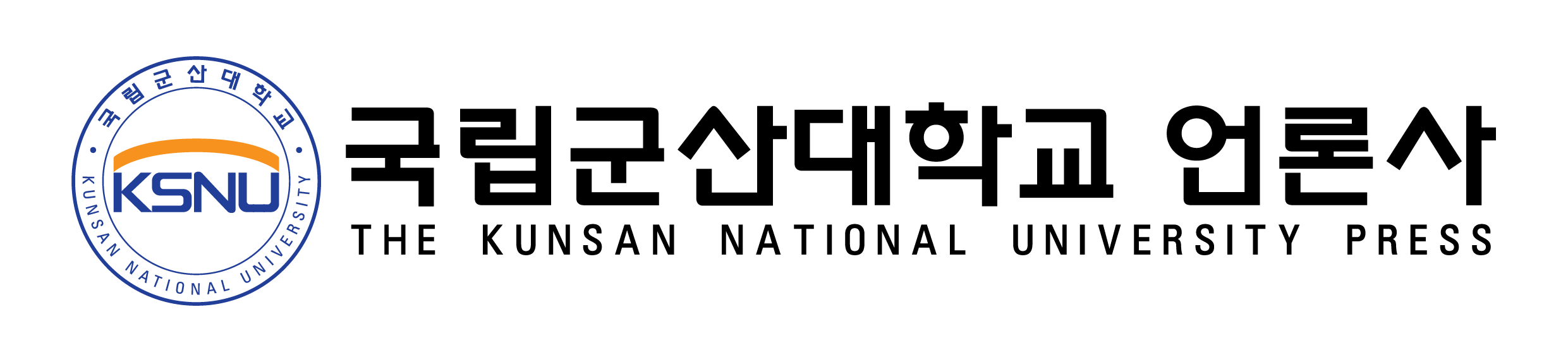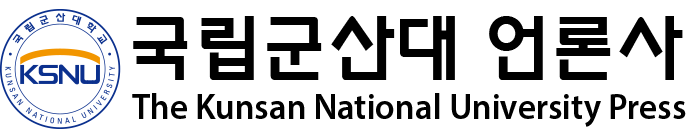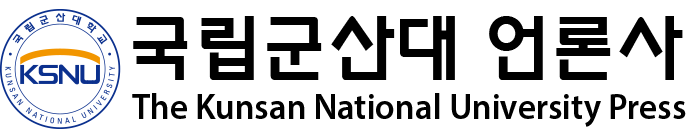군산(群山)이란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군산(群山)이란 땅이름은 한자로 풀어쓰면 무리群, 뫼山으로 산이 무리지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군산 어느 곳을 둘러봐도 북동쪽에 자리한 오성산, 취성산 일대의 해발 200 여m의 산들을 제외하고는 100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들만 곳곳에 펼쳐져 있다. 이름하고 땅이 그리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오히려 북쪽과 남쪽은 금강, 만경강으로, 서쪽에는 서해가 펼쳐져 있어 동쪽을 뺀 3면이 온통 물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군산이란 땅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에 앞서 땅이름 유래부터 살펴보면 군산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땅이름이 붙여지기 전 우리 고유의 땅이름은 그 곳을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해 준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고학 현지답사(field)를 나가기 전 맨 먼저 살피는 것이 땅이름이다. 이를 통해 절터, 성, 봉수, 무덤 등 수많은 유적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군산이란 땅이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리 진 산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문헌을 통해 보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현재 군산은 이 지역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군산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자리한 임피, 옥구, 회현이 시산군, 마서량현, 부부리현으로 불리면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었다. 지금의 군산은 그저 임피, 옥구에 속해 있었던 변두리일 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산이라는 지명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군산은 고려시대부터 문헌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군산이 아닌 고군산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고려 인종 원년(1123)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긍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후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군산도(?山島)”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무리지어 있는 산처럼 보이는 섬’이란 뜻을 가진 군산도는 실제로 고군산군도에 가보면 그 느낌이 한눈에 들어온다. 여전히 아름다운 섬 선유도를 중심으로 횡경도, 말도, 방축도, 신시도 등이 둥글게 둘러쌓인 듯 모여있어 육지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이니 말이다. 고려시대 때 지금의 군산의 실제적인 중심지는 나포를 포함하는 임피였으며, 그 곳에는 국가에서 사용할 곡물을 보관해 두었던 13개 조창 가운데 하나인 ‘진성창’이 있었다.
지금의 고군산도(古?山島)라는 이름은 이순신장군의『난중일기』(1597)에서 처음 나타나 고 조선 초기의 실록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얼추 조선 중기쯤부터 사용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다면 군산이라는 명칭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지금의 군산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624년, 군산도에 진鎭이 설치되었는데 그 이전에 옥구현 북쪽 진포의 군산진(群山鎭)과 구분하기 위해 고군산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설명이 옳을 듯하다.
무슨 연유에서 섬을 가리키던 군산이라는 지명이 진포가 자리하던 지금의 군산으로 옮겨져 왔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지역권 내에 수군을 두 개나 설치할 만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해와 금강을 지켜내야 했던 이 지역 사람들의 운명이 ‘고군산’과 ‘군산’이라는 지명에서도 읽혀지는 듯하다. 이와 같이 군산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연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땅 이름의 궁금증과 함께 과거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산이란 이름을 갖기 전 이 곳은 과연 어떠했을까가 궁금해진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산이라는 곳은 바다와 강이 만나 깊숙한 육지와의 길을 열어주는 관문임에 틀림없다. 이는 현재 뿐 아니라 선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 알아간다면 군산이라는 땅이 새록새록 재미있어질 것이다. 무수한 역사 속에서 바다와 강을 아우르는 물길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군산이 새만금사업과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요즘 우리 군산을 보며 드는 생각은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이왕 시작한 김에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