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글의 모든 것이 ‘진짜 나’는 아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졌던 적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축적돼왔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고등학생 때 썼던 글은 썩 읽어줄 만도 했다. ‘내가 이런 글을 썼다고?’라고 느끼는 구간이 여럿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글들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독서를 하면 작문실력이 는다는 말에 백번 공감하는 바이다. 매끄러운 문장 연결이 가능해지고 어휘력도 좋아진다.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논리 정연한 글이 만들어지고 논리를 입증하는 설득력도 갖추게 된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쓰고 싶은 어휘가 잘 생각이 안 나곤 했던 적이. 사실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책을 안 읽기 시작했다. 수능이 끝나고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때부터 영화는 나에게 소울메이트가 된 것 마냥 언제나 나와 함께였다. 하루에 2편, 3편씩 보는 날은 나에게 행복이었고 뿌듯함이었다. 영상미, 스토리, 사운드트랙 등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마치 나에게 영혼의 짝꿍인 것처럼 다가왔다. 옛날 같았으면 도서관에 가서 보냈을 시간에 영화관으로, 노트북 앞으로 가곤 했다.
그래도 글 쓰는 걸 좋아했던 탓에 어렸을 때부터 일기도 꾸준히 쓰고, 친구의 생일이면 편지도 자주 써주곤 했다. 사실 편지는 사람을 쉽게 감동시키기 좋은 도구 중 하나인데 나는 특히 더 “네 편지에 감동 받았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직접 입으로 전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감정 표현들을 글로 적으면 그나마 전할 수 있었기에 솔직한 심정들을 차분하게 글로 적어내려 갔었다.
‘편지, 쓴 적이 언제더라?’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하기 힘든 친구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받는 이의 주소도 알아야 하고 또 그 편지가 당일에 도착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정성스러웠던 일은 스마트폰 메신저가 등장함으로써 굳이 실천하지 않는 일이 돼버렸다.
지난 5월, 글쟁이 한 분을 알게 됐다. 하루에 한 편을 500원으로 계산하여 한 달간 총 20편의 수필을 보내주는 분이었다. 책 한 권을 다 못 읽는 요즘이었는데 메일 한 통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독신청을 했었다. 작가님은 주로 밤늦게 원고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전날에 온 글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읽곤 했었다.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다.
“나는 그 문장을 듣는 게 종종 황홀하여서 걔를 나무라면서도 만난다. 걔가 얼마나 가짜로 경솔한지 알아서 더욱 마음껏 나무란다.”
이런 문장들을 읽고 있노라면 글이 가진 표현력에 감탄을 느끼곤 한다. ‘가짜로 경솔한 것’ 완벽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글 앞뒤의 맥락을 살펴 해석하자면 이러하다. 이 작가의 친구는 작가에게 농담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 농담들이 그 친구의 모든 속마음을 대변해주지는 않더라, 라는 말이었다. 작가는 그 농담과 그 친구의 속마음을 ‘진심과 입담 사이의 간극’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간극을 또 ‘가짜로 경솔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매일 글을 쓰지만 ‘이게 진짜 내 글일까? 습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어릴 적 내 마음을 대변해주곤 했던 글들이 소중하고 그립기도 하다. 나는 언제쯤 또 그런 글들을 쓸 수 있을까? 까마득하지만 다시금 글자의 나열들을 오래토록 읽어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기분이었다.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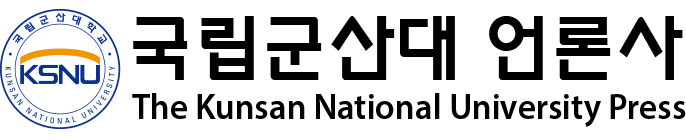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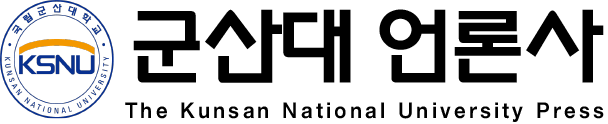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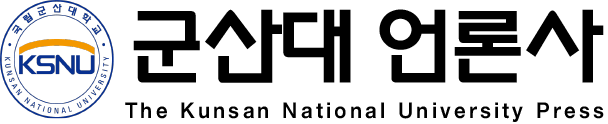
![국립군산대 신문 559호 [신년호] (2024-01-04)](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2024/02/atbhot_202402140527.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