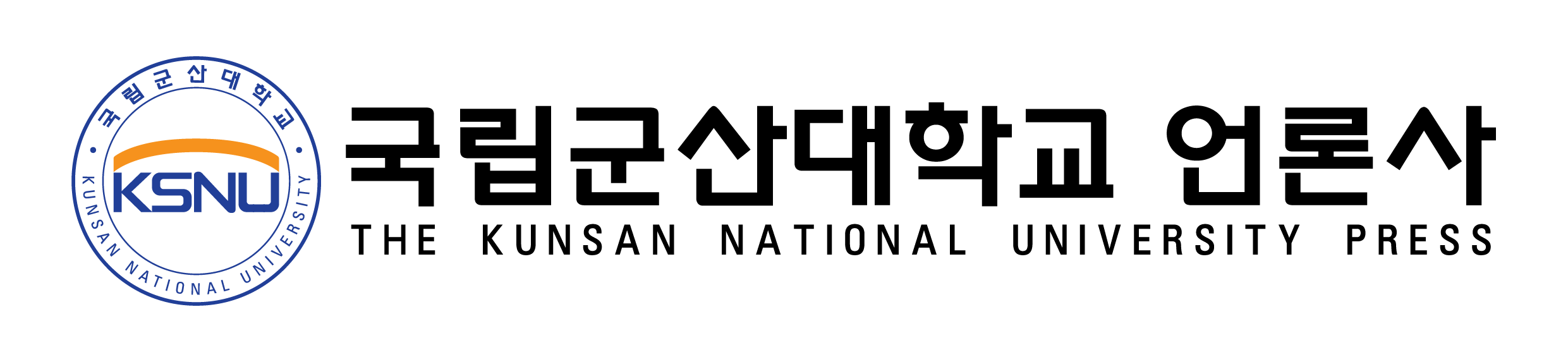걸어야 할 때, 뛰어야 할 때
나에겐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 다짐이 있다. ‘이번 방학은 정말 알차게 보내야지.’라며, 종강을 맞이하기 전부터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자 매번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었다. 바쁘게 한 학기를 지내다 보면 종국에는 놓쳤던 것들이 많았었다는 아쉬움에, 학기 중에 미쳐 못다 한 일들을 방학 때는 이루고자 했다. 대외활동, 자격증, 토익 등 여느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며 살아왔지만, 최근 나에게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다. 어려운 과제에 부닥치거나,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무심코 ‘내일의 내가 하겠지?’ 생각하고는, ‘내일의 내가 하겠지.’라며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미뤄진
일상의 순간을 기록으로, 지나간 시간은 추억으로
초등학생 때 나는 매일 저녁 꼬박꼬박 일기를 쓰곤 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자의로 썼던 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나에게 일기란 과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공원을 돌며 맡았던 아카시아 꽃냄새, 엄마와 함께 심은 가지 등 모든 것이 새로웠던 하루의 일과는 매일 밤 적는 일기의 새로운 주제가 됐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